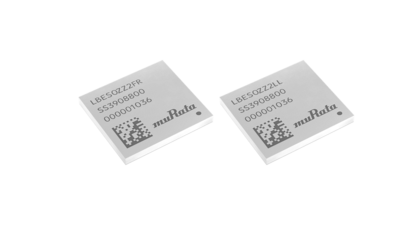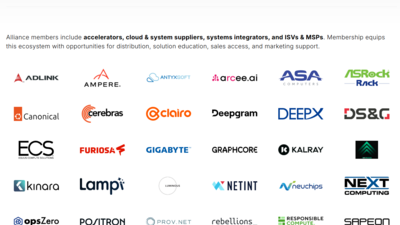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최 사장은 본래 그렇지. 부처 가운데 토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너 말이야. 이년아,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나지연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난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이름 따위를 기억해서 뭘 하냐.』
『나도 맛이 괜찮거들랑요.』
『그걸 어떻게 알아? 허리가 가는 년보다 나는 젖통이 큰 년이 더 좋아. 가는 허리가 안겨서 흔들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커다란 젖통 위에서 헤엄치는 맛이 더 죽여주지. 그건 그런데 최 사장이 가만히 있다고 너도 점잔을 뺄 거야? 옆에서 좀 유혹을 해봐라. 그 남자는 숫총각이야.』
『어머, 오빠 정말 숫총각이야? 숫총각이면 내가 먹고 싶다.』
키 큰 여자가 말하면서 한 손이 나의 사타구니로 들어와서 그것을 만졌다. 내가 그녀의 손을 치웠다.
『어머, 정말 숫총각같네. 그럼 뭘 모르겠네. 재미가 없잖아.』
『숫총각이지만 경험을 할 것은 다했다. 최 사장은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론 호박씨를 까지. 일본의 밤무대 라이브 쇼에서 춤추는 여자의 그것도 만져본 사람이야.』
『그거라니요? 젖요?』
키 작은 여자가 배용정에게 몸을 붙이면서 물었다.
『젖이면 말도 안하지. 너의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배용정은 여자의 아래쪽으로 손을 쑥 넣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뭘 그렇게 앙탈이야.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아주 얌전한 척하지 마라. 너희들 자갈마당에서 왔지?』
자갈마당은 창녀촌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가 본 일은 없지만, 대구에서 자주 머물렀던 배용정을 통해 들었다.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린 달라요.』
키 큰 여자가 눈을 흘기면서 말했다. 술에 취해서 그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는데, 방안의 핑크빛 조명 때문에 눈이 붉게 보였다.
『웃기지 마라, 이년들아. 코에 거나 귀에 거나, 거는 액세서리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너희들 여기서 강강수월래 한 번 할래?』
『그게 뭔데요?』
키 큰 여자가 웃으면서 물었다. 웃는 표정이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6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7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8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9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어떤 길도 거침없는 프리미엄 SUV”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