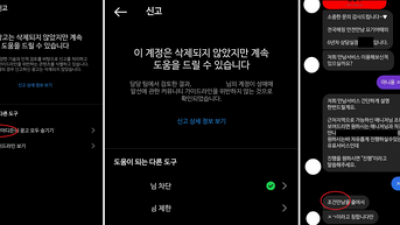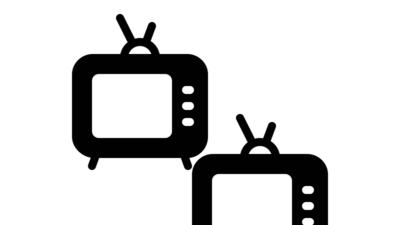반도체 빅딜이 전격 성사되면서 이제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빅딜의 여세를 몰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 또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빅딜 실사 또한 이번주부터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 성사는 이제 시간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은 경제논리를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반도체 이상의 특단조치가 요구되며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자업계 종사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빅딜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수합병(M&A)이란 무엇보다도 인수하는 업체나 인수당하는 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있을 때에만 성사 가능한 경제적 행위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로 삼성전자가 대우전자를 인수할 경우 이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가전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이 전체의 17%선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백색가전부문을 점차 축소하고 대신 통신·컴퓨터·반도체와 이를 융합시킨 정보가전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대우전자는 영상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이 57%이고 백색가전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이 43%에 달하는 순수 가전업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대우전자를 인수할 경우 이미 사업축소 작업에 돌입한 가전부문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져 삼성전자의 21세기 미래비전을 위한 자체 구조조정에 상당한 짐으로 작용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우전자 또한 삼성전자에 인수될 경우 어떤 이득도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삼성전자가 대우전자의 인수로 대우전자의 가치보다 더 많은 플러스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대우전자가 확보해 놓고 있는 시장을 삼성전자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설비와 인력이 과다해져 이에 따른 고용불안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대우전자 인수는 인수 주체나 대상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빅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과당경쟁 또한 가전산업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내 가전산업은 빅딜대상 사업군인 중공업이나 화학·자동차 등과는 달리 해외시장에서 70%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영상부문의 경우 생산의 해외이전이 50% 이상 진전돼 있는 상태이고, 백색가전의 경우에도 수출 전진기지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가전산업은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부실화의 우려가 거의 없는 상태다. 오히려 그동안 삼성전자가 고가전략, 대우전자가 중저가전략을 전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보다는 동반자적인 관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재계 간담회 이후 전격 발표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은 경제적 고려는 전혀 없이 이루어진 셈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대우전자 인수가 양자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도 못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이유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실 내지는 부산물이라는 인식은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삼성전자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아직까지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는 대우전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 효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따라서 정부나 삼성과 대우 양 그룹이 대우전자의 빅딜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나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대우전자의 빅딜은 재고돼야 한다. 세간의 소문대로 대우전자가 자동차 빅딜을 위한 희생양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빅딜을 통한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의 통합이 과연 지난 수십년간 어렵게 쌓아온 국내 전자산업의 틀을 일거에 허물고 오히려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첫 공개…“앱 하나로 3초면 끝나”
-
9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10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