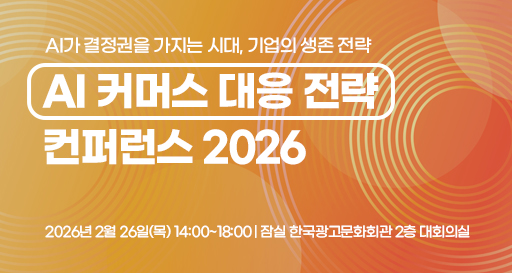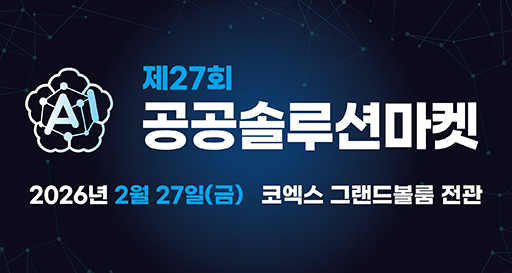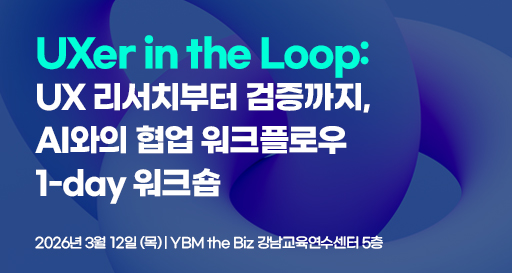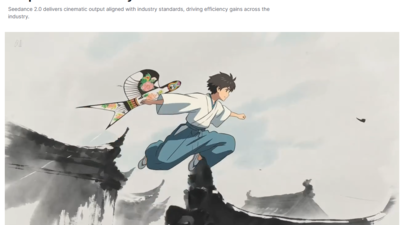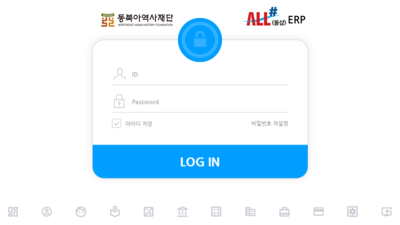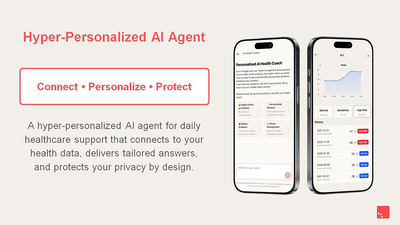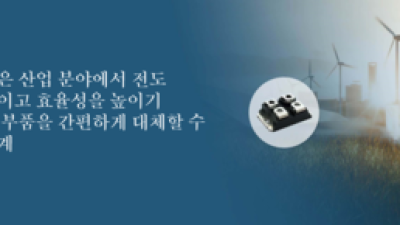대구지하철에는 아픈 역사가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95년 도시가스관에서 유출된 가스가 하수관을 통해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돼 도시가스가 폭발한 사고와 2003년 1호선 중앙로역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50대 남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8일에는 지하철 참사 22주기 추모식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박성찬 유족 대표와 유족들, 대구지역 정치권, 노동계, 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 대표단을 통해 추도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한 때 대구 시민들 중에서도 사고 이후 지하철을 믿지 않는다거나 가급적 피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사고의 여파는 컸다.
과거 사례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었는 지 사고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 사고로 한국의 철도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돼 우리나라 모든 철도차량의 내장재가 2006년까지 불연재로 교체됐고 대구지하철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2021년 5월 '재난안전무선통신망'사업에 따라 기존 TRS 방식을 제4세대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전국적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개통한 것은 의미가 크다.
PS-LTE는 공중통신, KTX 등 고속철도에 적용되는 LTE-R 과 같은 무선통신 방식(LTE)을 사용하므로 인접국간의 혼신 문제 해소등 숙제가 있었으나 모두 해소됐다.
대구지하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에 건설된 도시철도이며, 신설공사는 대구시가 담당하고 기존 시설의 운용과 개수공사는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구교통공사가 맡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세개 노선의 운행으로 도심의 교통문제 및 대구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5년 기초연구 결과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대구시 지하철 기획단이 설치되었고, 건설 계획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1년 1월에 건설 및 운영의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
1호선은 대구 시가지의 서남부에서 도심을 거쳐 동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1991년 12월에 착공해 1997년 11월 진천∼중앙로 간의 10.3㎞ 구간을 부분 개통한 이래 점차 구간을 늘려 2024년에는 안심∼하양 구간을 연장해 총연장 약 40㎞에 35개 역을 운영하고 있다.
2호선은 대구시 서부에서 도심을 거쳐 대구의 동남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1996년 12월에 착공해 2005년 문양~사월 간의 28.0㎞ 전 구간을 개통하고 경산시에 3개역을 신설한 이후 사월∼영남대 간의 연장 공사가 2012년 9월 완공돼 2호선 29개역,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경량전철인 3호선은 2009년에 착공된 이래 칠곡경대병원~용지 구간 등 30개의 역이 건설되어 2015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모노레일형 도시철도로 하늘열차(Sky Rail)라고도 불리며 이용량이 많아 관광열차로서의 역할도 충분하다.
추진 중인 4호선은 2026년 착공해서 2030년 개통목표로 3개 주요 환승역인 동대구, 범어, 수성구민운동장을 거쳐 총 12개역으로 운용된다. 5호선은 대구를 동서남북으로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며 용역이 완성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하철 참사 이후 역사증설과 차량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조치로 어느 도시 못지 않은 쾌적한 지하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VHF 열차무선설비를 철도통신망의 대세인 LTE-R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통신망의 개체를 서두르고 있다.
1호선 안심~하양간 신설구간은 처음부터 LTE-R 시스템으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완성했으며 전국 최초로 KTX 통신망과 중첩구간을 양방향 무선망 기지국 공유(RAN-Sharing) 기술을 적용하여 혼신을 제거했다. 기존의 설화명곡~안심의 구간도 2024년 3월 시작해 12월까지 VHF 시스템을 개체하여 전구간을 LTE-R 로 운용하고 있다.
2호선 통신시스템은 약 20년이 경과된 VHF 시설로서 LTE-R 방식으로 개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가 준공되면 지금 보다 훨씬 좋은 통신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체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설공사에 비해 애로사항이 많다. 지하철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이 운용되지 않는 야간에만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공사시간이 짧고 야간이라는 핸디켑이 공사를 어렵게 한다. 물론 운행을 마친 후 차량점검이나 레일연마 작업, 집진장치의 점검 등도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남모르게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구지하철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최명선 전 KAIST 교수 mschoi020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