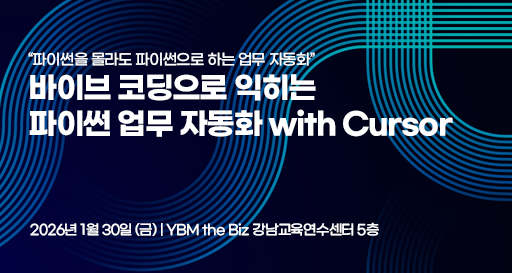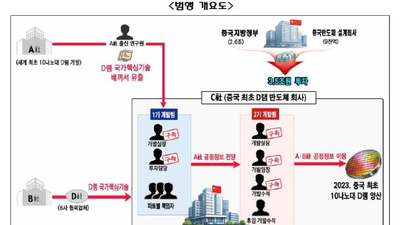산업연구원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미국 제조업과의 산업적 연계성에 기반한 구조적·필연적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에 양국간 통상 협상에서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미 양국간 무역수지 구조를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주요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각은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제한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 의존도 확대에 주목했다.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의 대미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의존도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러한 흐름은 2015년 이후 본격화된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맞물려 나타난 변화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 확대 →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산업 연계성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점차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 같은 연계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 연계 속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 관련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가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오랜 기간 기능해 왔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결코 불공정한 결과가 아니라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임을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상 협상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