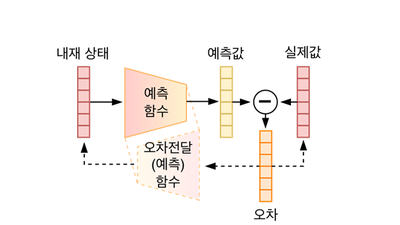북극권, 즉 북극과 인근 고위도 지역에는 오랜 기간 꽁꽁 언 형태로 남아있던 영구동토층이 있다. 근래 이곳의 기후가 심상치 않다. 2020년 6월 북극권인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 마을의 경우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은 사례가 있을 정도다. 극심한 기후변화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지 영구동토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영구동토 해빙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재앙의 전조'다. 우선 영구동토에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이 녹아 외부로 방출되면 그만큼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기후변화 가속화와 해빙이 반복되는 파멸의 굴레다.
최근 보다 직접적인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구동토에 묻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 얘기다. 4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 국제 연구진은 시베리아 야쿠츠크 지역에서 채취한 영구동토 샘플에서 새로운 13종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의학 논문 사전 등록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가장 오래된 바이러스가 5만8500년 전 얼음에 묻혔다고 밝혔다. 또 이들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 전염력을 갖췄다고 했다. 되살아났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좀비 바이러스'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들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연구 이전에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노출된 병원체가 사람을 해친 사례도 존재한다. 2016년 북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는 35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아 동물 사체가 드러난 일이 있었다. 당시 이에 접촉한 어린이 1명이 탄저병에 걸려 숨지고, 성인도 다수 감염된 사례다. 2000마리가 넘는 순록도 떼죽음을 당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1941년 이후 이때 처음으로 탄저병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1941년 당시 감염 동물 사체가 노출되면서 병이 퍼진 것으로 봤다.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병원체가 70년을 뛰어넘어 실제 사람에 해를 끼친 것이다.
가장 큰 우려 점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이 영구동토층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 세상을 활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험하지 못한 병원체는 당연히 대처할 방안도 마련하기 어렵다.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다. 고대 병원체가 현재 환경과 접하면서 본래보다 더욱 위험하게 변이할 수도 있다.
과거의, 혹은 경험한 적 없는 병원체가 창궐하는 일은 소설이나 영화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영화로도 유명한 소설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묘사됐다. 지구를 정복한 외계인들을 몰아낸 것은 인류의 군사 반격이 아닌, 외계인들이 접한 적 없던 세균과 바이러스였다.
새로운 세균과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얼음 속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공포를 안긴다. 일례로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진은 티베트고원 빙하에서 총 33개 바이러스 유전정보를 발견했다고 2020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8개가 우리 경험 밖의 것이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세계 곳곳의 얼음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수없이 존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계속돼 얼음이 지속해서 녹는다면, 뜻하지 않게 새로운 병원체가 풀려나 또 다른 팬데믹 사태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