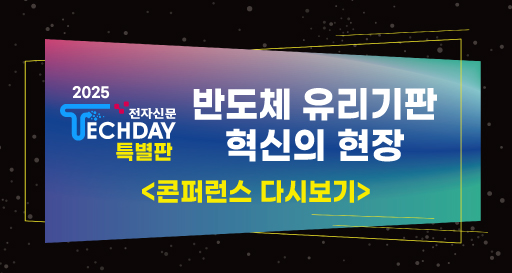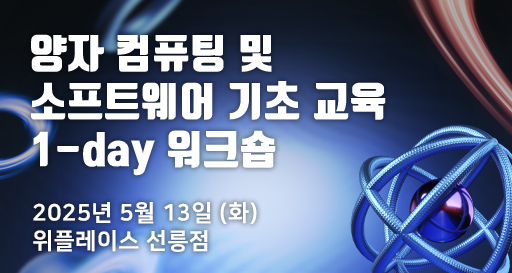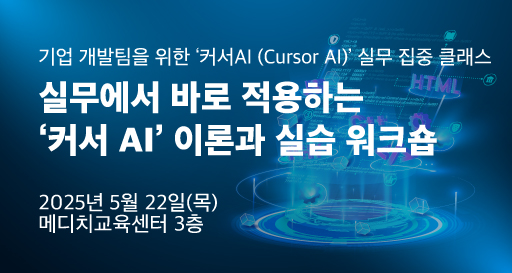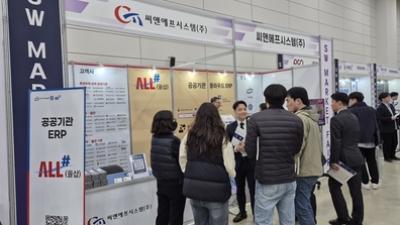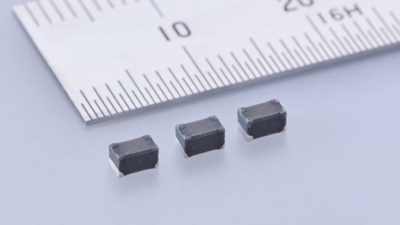금융위원회가 대대적 금융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은행, 여신,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234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모두 공개했다. 금산분리 등 시장 패러다임 변화 차원의 건의도 있지만 세세한 업권별 건의까지 모두 금융위에 쏟아졌다.

금융위가 접수한 업권별 규제를 보면 이해가 상충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 제안한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 건의 경우 일부 빅테크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초대형 금융사가 거대 자본력을 무기로 해서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면 사실상 빅테크가 대항하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최근 고정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은 금융권과 핀테크 업권 모두에 최대 화두가 됐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고정금리,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찾는 게 절실해졌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빅테크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고, 상당한 여신 성장 효과를 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소외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막강한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자리 잡자 저축은행들이 여신 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 플랫폼에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족한 정보기술(IT) 인력과 리소스를 중소 핀테크가 아닌 빅테크에 우선 투입하느라 중소 핀테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말도 들린다.
중소 핀테크는 금융사와의 신규 제휴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동시에 플랫폼 종속 우려 대상이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빅테크 영향력은 더 커지고 중소 핀테크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약 2년 전 오픈뱅킹 첫 도입 당시로 돌아가 보자. 당시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폐쇄적인 금융인프라 전면 개방에 따른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은행 간 주거래 사용자의 이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결과적으로 오픈뱅킹 도입으로 인한 고객 변동이나 실적 하락은 없었다.
오히려 다양한 금융사의 계좌를 한 곳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며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 오픈뱅킹 전면 도입으로 토스 같은 혁신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금융사들은 서비스형뱅킹(BaaS) 모델을 준비하며 금융 문턱을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오픈뱅킹 도입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오픈뱅킹으로 전통 금융사, 핀테크와 빅테크, 금융 소비자 모두 혜택을 봤다는 평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 파이낸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융사는 업권을 막론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도약, 핀테크와 빅테크는 예금중개업 등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금융중개 서비스 확대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파격적 규제완화 기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완화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의 하나다.
여기에 '업권 간 상생'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소수 빅테크 플랫폼 또는 소수 초대형 금융사가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종속성을 키운다면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시장 상생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파격적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앞두고 오픈 파이낸스의 핵심 가치는 장악이나 종속이 아니라 개방과 상생이라는 점을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