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의 법칙.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 생산용량이 클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좀 단순하기는 하지만 컨테이너를 생각해 보면 셈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어느 정육면체의 한 변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이 컨테이너 제작에 '1×1'짜리 철판이 6장 들어간다.
그런데 이 길이를 2배로 하면 면당 '1×1'짜리 철판 4장이 필요하니 결과적으로 표면적은 6에서 24로 4배 늘어난다. 그런데 이 큰 컨테이너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은 8배로 늘어난다. “더 크게, 더 크게”를 추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혁신은 다양하다. 아니 무한한 모양과 그만큼 다양한 방식이 있는 법도 하다. 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단지 몇 개일지도 모른다. 마치 하나의 수학 법칙 예제는 수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탓일까. 혁신의 성공사례와 지침서가 수도 없이 많지만 정작 핵심 원리는 간과되고 왜곡된다. 토요타 생산시스템에 관한 꽤 잘 알려진 한 아티클은 “흥미로운 것은 토요타 관행이 그토록 잘 알려졌음에도 모방에 성공한 기업은 별로 없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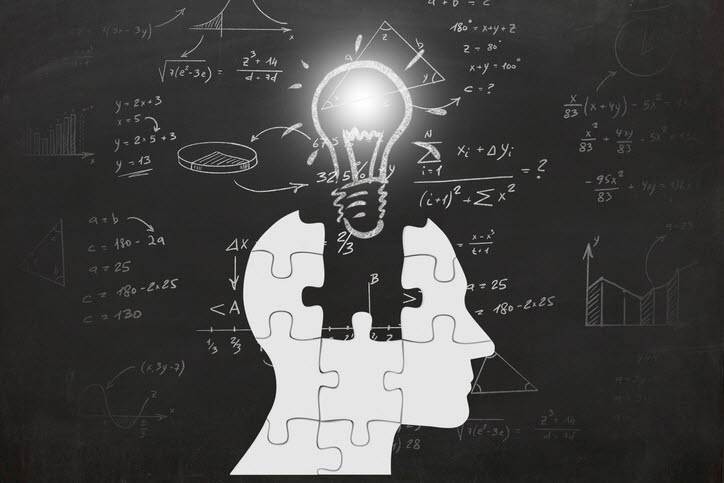
이런 사례는 많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성공하자 그 성공 요인에 관해 수많은 기고문들이 언론을 장식한다. 보잉 737 한 모델만 사용했고, 외진 공항을 사용한 탓에 적은 사용료를 냈으며, 낮은 인건비, 최소한의 기내 서비스에 버뮤다풍 반바지를 입은 재미있는 승무원까지 말이다.
여느 유행이 그런 것처럼 다들 따라 하기에 나선다. 콘티넨털 항공은 라이트란 저가항공 브랜드를 만들었고 델타는 송, US항공은 메트로, 유나이티드는 테드를 출범시켰다. 다들 나름의 색깔을 넣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 나름의 이유도 별 소득 없이 끝난다.
이 시도들이 실패로 판정될 즈음 누군가는 사우스웨스트의 성공이 꽤 단순한 원리였다고 말한다. 바로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어야 돈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쯤 기존 항공사는 연결편 승객을 태우거나 출발 지연을 피하기 위해 다음 출발까지 여유를 두고 있었다. 좋게 표현해 고객 지향 스케줄링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럴수록 비행시간은 줄기 마련이었다. 반면 사우스웨스트는 20분 만에 다시 하늘에 띄우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항공기를 20~30퍼센트 더 긴 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게 됐다.
기존 항공사처럼 허브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대신 버스처럼 정해진 루트를 도는 방식도 일조했다. 허브 방식에선 한 대가 늦게 도착하면 차례로 몇 대씩 밀리기 일쑤다. 그러니 몇 대씩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줄었다. 하지만 루트를 도는 방식이야 그다음 비행기엔 별 영향이 없었다. 거기다 마지막 비행기로 원래 공항에 돌아오는 탓에 승무원 숙박료나 경비도 절감됐다.
훗날 콴타스 항공은 여기에 풍미를 더한다. 버진블루가 저가로 단숨에 시장 30퍼센트를 장악하자 얼마 후 콴타스는 자신의 저가 브랜드인 제트스타를 출범시켜 하방 시장을 막는다. 그리고 콴타스는 자신만의 고품질 서비스로 천장을 씌운다. 이렇게 버진블루를 아래위로 감싼다.
원리가 단순하다고 간단한 것도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 만큼 변형의 묘도 다양하기 마련이고, 많은 이들은 이 다양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이 모호함과 막연함을 이겨 냈고, 꽤 멋진 원석을 찾아내고 있는 듯싶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