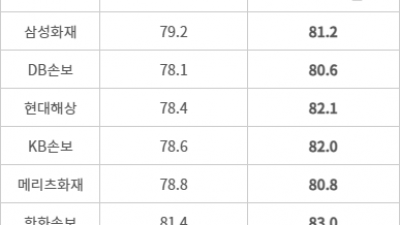“원한다면 각서라도 써 주고 싶은 생각이다.” 특허청이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관계기관 협의'에 발목이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관계기관이 '조직 빼앗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서라도 써 주겠다는 특허청 이야기는 실제 협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변하고 있다.
특허청은 기관명이 일반인에게 어렵고 권위적 사고를 띠고 있다며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업무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을 다루고 있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지적도 명칭 변경에 힘을 싣고 있다. '특허'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는 점은 다른 무엇보다 명칭 변경이 시급한 명분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기본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저작권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특허청 명칭 변경이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허청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없다는 이견이다. 명칭 변경 이후 관련 부서 간 업무 중복과 혼선 초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특허와 저작권 등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 창작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관련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만 특허청 명칭 변경을 두고 서로의 명분 싸움이 자칫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직을 빼앗아 몸집을 불리거나 내 기존 업무 영역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로 유리한 명분 찾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굳이 부처 간 각서까지 쓰지 않더라도 급변하는 지식재산 시대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효율성을 따져 가며 업무를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할 뿐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