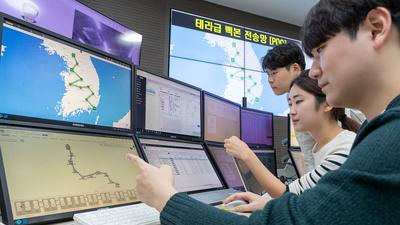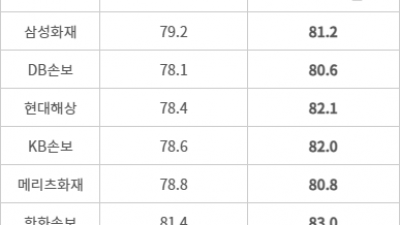정확하지는 않지만 3~4년 전 9월께 비 오는 날로 기억된다.
서울 광화문에서 모임을 마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지하철을 타면 되지만 연결되는 차편이 끊겨 한참을 걸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순간 판단에 택시를 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기 시작했다. 광화문에서 택시 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택시를 기다렸다. 빈 택시도 꽤 보였고,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요금을 조금 더 내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설마'는 '아뿔싸'가 되고 말았다.
조수석 창문을 살짝 내린 빈 택시는 행선지를 듣고선 한마디 답변도 없이 지나갔다. 앱으로 평상시에 거의 타지 않는 모범택시까지 호출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집 쪽으로 가면서 택시를 잡기로 하고 계속 걸었다. 결국 1시간여 빗속을 걷다가 새벽 1시가 거의 다 된 시간에 겨우 택시를 잡아탈 수 있었다. 절반 정도 걸어온 상황이었지만 1시간을 더 걷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태워 준 택시기사에게 감사 인사부터 건넨 것으로 기억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핵심은 타다 서비스가 '혁신이냐 불법이냐'이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만큼 재판에 쏠리는 관심도 크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 '이용자' 또는 '이용자 편리'는 빠져 있는 것 같다. 타다가 혁신인지 아닌지를 떠나 일단 이용자는 많은 선택을 한다. 단순 숫자만 따져도 택시나 타다 종사자는 물론 이에 직간접 연관된 사람보다 이용자가 훨씬 많다. 조직화되지 않고 직접 이해관계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침묵한다고 생각이나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100만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까.
타다 이용객의 높은 만족도는 '서비스'에 기인한다. 기사는 탑승객과 사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탑승 직후 차내 온도와 라디오 볼륨이 괜찮은지 묻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불필요한 말은 건네지 않는다. 차량 이동 시간 동안 탑승객의 '쉼'을 지켜 준다. 이외에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킨다. 청결과 안전운전은 기본이다.
특히 탑승 거부가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목적지의 멀고 가까움이나 접근의 어려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객이 지정한 정확한 지점에 내려 준다.
기사가 직접 문을 열어 주는 등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다.
타다의 성공은 혁신 플랫폼 성공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근간을 따져 보면 '고객 중심'이라는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기존 택시가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타다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물론 모든 택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비오는 밤, 비에 젖은 손님을 태워 준 '택시기사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고객 입장에서 우선할 것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타다를 막아 낸다고 해도 새로운 경쟁자는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다. 사회 합의 없이 매번 법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다만큼, 타다같이'를 생각하는 게 먼저다. 요금을 올릴 때 매번 내세우는 서비스 질 개선이 생존의 기로에서 택시에 새로운 사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