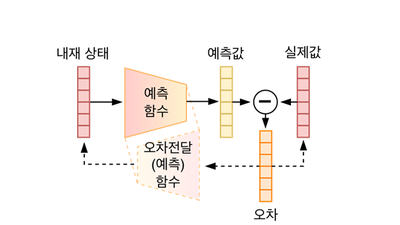2019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세계 과기계가 들썩였다. 생리의학, 물리, 화학 등 각 분야에서 수십 년간 진행해온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9명이다.
7일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윌리엄 케일린 미국 하버드대 교수, 그레그 세멘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피터 랫클리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은 유기체 내 세포가 산소 공급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기전을 규명했다. '산소 가용성'(Oxygen Availability)이라는 개념을 확립해 암이나 빈혈 등 난치성 질환 치료 길을 열었다. 인간이나 동물은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를 섭취한 음식과 함께 에너지로 변환한다. 산소 수치는 운동을 하거나 고도의 높낮이 혹은 상처가 났을 때 등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때 새로운 적혈구 또는 새 혈관 생성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전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관여할 수 있다면 암이나 빈혈 등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8일엔 제임스 피블스 미국 프린스턴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석좌교수, 스위스 제네바대의 미셸 마요르 명예교수와 디디에 쿠엘로 교수가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피블스 교수는 우주 역사와 진화 과정을 밝혀내는 데 초석을 놓은 '현대 우주론의 대부'다. 지난 50년간 우주론이 추측의 영역에서 과학으로 변모하는 데 기초를 놓았다. 그는 빅뱅이 남긴 우주 초기의 흔적인 우주배경복사(CMB)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와 계산 방법을 찾았다. 현재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matter)이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미지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그의 연구 덕분이다.
마요르 교수와 그의 제자인 쿠엘로 교수는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1995년 10월 우리은하 안에 있는 태양형 별의 주위를 도는 외계행성(51 Pegasi b)을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는 '천문학의 혁명'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외계행성을 탐색하는 관측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했다.
9일엔 존 구디너프 미국 텍사스오스틴대 교수와 리차드 휘팅엄 빙햄턴 뉴욕주립대 교수, 요시노 아키라 아사히카세이(일본 화학회사) 박사가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70년대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에 몰두한 휘팅엄은 '이황화 티타늄'(TiS2)을 이용해 에너지를 고도로 담을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로 사용했다.
구디너프는 산화코발트를 양극재로 이용해 두 배나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요시노는 1985년 구디너프의 양극재와 반응성이 강한 금속 리튬 대신 석유 코크스를 사용한 음극재를 개발, 가볍고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다. 현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들의 연구 성과로 빚어진 산물이다.
올해도 미국의 저력이 두드러졌다. 미국 과학자 네 명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 영국과 스위스가 각각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일본도 영예를 안았다.
이는 누적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가 271명(43%)으로 가장 많다. 영국(89명14%), 독일(70명, 11%), 프랑스(34명, 5.5%)가 뒤를 잇는다. 아시아에서는 24명을 배출한 일본이 최다다.
특히 일본은 2000년대 들어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과학 강국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2014년 물리학상, 2015년 생리·의학상, 2016년 생리·의학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지난해와 올해도 연이어 수상했다.
부러운 현실이다. 기초 과학, 산업 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추격하는 우리나라는 격차를 상당 수준 좁혔지만 매년 10월이 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한다.
과기계는 노벨상을 수상할 만할 수월성이 높은 연구 성과를 얻으려면 긴 호흡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20년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151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핵심연구 산출기간은 평균 16.9년으로 조사됐다. 핵심연구와 노벨상 수상 간 시간차는 평균 14.5년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해 노벨상을 받기까지 평균 3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수상자 연령을 보면 70대가 전체 30.4%(46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27.8%, 42명), 50대(19.8%, 30명), 70대(14.5%, 22명), 40대(5.9%, 9명), 30대(1.3%, 2명)순이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케일린(만 61세), 피터 랫클리프(만 65세), 그레그 서멘자(만 63세) 등 모두 60세 이상이었으며 노벨화학상을 받은 존 구디너프는 만 97세로 역대 최고령 수상자였다.
내년 노벨상의 영예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괄목할 연구 성과를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연구를 지속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