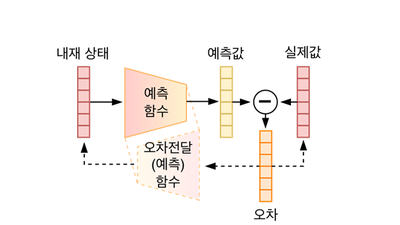한 글로벌 커피 기업이 국내 100개 매장에 시범적으로 친환경 종이 빨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화제다. 이 회사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 매장 빨대 소비량은 총 1억8000만개. 당장 전부를 대체하지 못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얼마 전 한 외식업체도 국내 업계 최초로 '쌀 빨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이 빨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00년 넘게 굳어진 '빨대=플라스틱' 공식이 깨지는 것일까. 단언하긴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빨대의 역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빨대가 큰 변화를 맞이했던 몇 번의 사례처럼 말이다.
빨대는 작동 원리가 간단하고 만들기도 쉽다. 빨대를 음료에 넣고 한쪽 입구를 입을 대고 빨아들이면 음료 안의 공기가 입으로 빨려 들어간다. 음료 안 공기의 압력이 주변 공기 압력보다 낮아진다. 무거운 바깥 공기가 음료를 밀어내면서 음료가 빨대를 타고 입으로 들어간다. 음료를 빨아들였다가 위쪽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면, 빨대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 이는 빨대의 뚫린 아래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와 음료를 들어 올리는 상태에서 막힌 윗구멍으로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옛날부터 다양한 재료로 빨대를 만들어 사용했다. 빨대의 영어 명칭인 '스트로(straw)'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빨대는 밀짚 등 대롱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빨대를 발명한 것은 수메르인으로 알려져 있다. 목적은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였다. 당시 맥주는 바닥에 앙금, 윗물에는 찌꺼기가 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중간 부분을 마시기 위해선 빨대가 필수였다. 수메르인이 활동한 지역에서 5000년이 된 금으로 만든 빨대가 발굴되기도 했다.
빨대가 양산되기 시작한 것은 길고 긴 빨대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 최근 일이다. 최초로 빨대를 양산, 판매한 인물은 미국인 마빈 C. 스톤이다. 1888년 담배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던 그는 선술집에서 위스키를 마시다 주인이 제공한 빨대 용도의 호밀 줄기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당시 술집에서는 손으로 잔을 만져 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밀 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호밀 줄기 빨대는 위스키 맛을 변질시켰다. 스톤은 종이를 둥글게 말아 접착제로 붙인 종이빨대를 만들었다. 종이빨대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는 아예 공장을 차려 양산에 나섰다.
빨대는 1930년대에 다시 큰 변화를 맞는다. 미국인 조지프 B. 프리드먼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음료상점에서 자신의 딸이 종이빨대로 음료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 아이디어를 얻었다. '빨대에 주름을 넣어 구부려 컵에 걸쳐 놓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는 빨대 안에 나사를 집어넣고 홈을 따라가면 치실을 감아 바로 주름을 만들었고 이를 제품화했다. 구부러지는 빨대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을 줬다. 누워서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1937년 최초 특허를 출원했고, 1950년 주름빨대 형태와 제조방법 관련 특허 5개를 미국과 해외에 출원했다. 프리드먼은 '플렉시블 스트로'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1969년 한 컵 제조회사에 인수되면서 큰 돈을 벌었다.
석유화학 산업 발전과 함께 빨대 재료는 자연스럽게 플라스틱으로 대체됐다. 종이나 사탕수수 등 자연원료에 비해 가격이 10배가량 싸고 양산에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다. 미국의 하루 빨대 사용량은 5억개, 유럽에서도 하루에 약 1억개 빨대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빨대 하나가 분해되는 시간은 약 500년.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가 토양,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과거 빨대 주재료로 쓰인 종이, 쌀, 사탕수수가 다시 등장한 배경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누군가 값싼 친환경 빨대를 개발, 양산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세계 부호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