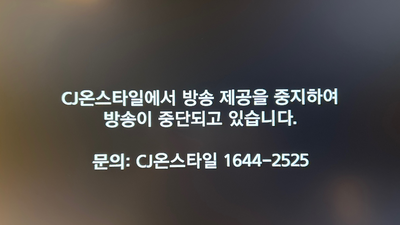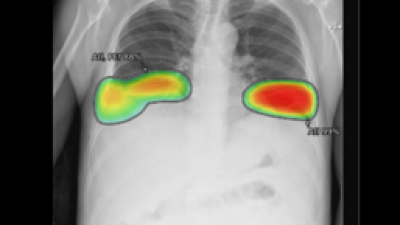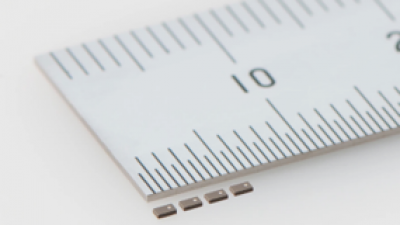게임질병화를 추진·찬성하는 쪽은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중독 판별 기준으로 제시한다. 노력을 해도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나 몰입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개월 기준으로 게임 이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게임질병화를 찬성하는 쪽은 이에 해당하는 '환자군'이 사회적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독포럼 상임이사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올해 5월 신경정신의학회보 기고를 통해 “(국제질병분류(ICD)-11이 제시한) 게임장애는 주요 기능 영역의 심각하고도 유의미한 손상과 감퇴를 필수적 진단 조건으로 제시해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1~2%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게임장애 진단 기준 제정에 대해 '모든 게임 게이머를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한다면 지나친 비약과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기우”라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청소년 중 문제적 게임이용형태를 보이는 게임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을 합치면 전체 2.6%에 달한다. 전국 441개교 초·중·고생 12만68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WHO, 중독포럼과 비슷한 기준을 대입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100명 중 2명 이상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에 의료계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충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다양한 게임 플레이 패턴을 획일화 해 진단한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 이용패턴은 2010년 이후 모바일게임이 주류로 떠오르며 자동전투 등을 활용한 간접 플레이 방식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특히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 사례인 역할수행게임(RPG) 분야는 이 같은 영향이 뚜렷하다. 이용자가 실제로 게임을 조작하지 않고 가끔씩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 플레이가 완성된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펴낸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람 5판(DSM-5)'은 게임장애 증상에 약 9가지 진단척도를 제시한다. ICD-11은 이보다 적은 4~5가지 기준으로 게임장애를 판단한다.
DSM-5는 게임장애를 정식질환으로 등재하지 않고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종종 ICD-11 게임장애 기준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ICD-11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편람도 게임장애가 질병이라는 판단을 미뤘다는 것이다.
정의준 건국대 교수는 “ICD-11 게임장애 기준은 매우 일반적인 중독기준을 제시해 비판에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표1> 인터넷 게임중독 선별 도구(IGUESS), 12개월 기준 '자주' 또는 '항상'이라고 응답한 문항이 5개 이상인 경우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장애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출처:중독포럼>
표2> WHO가 제시한 게임사용장애의 진단기준 <출처: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이슈분석]'조절력 상실' 게임장애 핵심, 청소년 100명 중 최소 2명 '환자'](https://img.etnews.com/photonews/1806/1085168_20180626122730_907_T0001_550.png)
![[이슈분석]'조절력 상실' 게임장애 핵심, 청소년 100명 중 최소 2명 '환자'](https://img.etnews.com/photonews/1806/1085168_20180626122730_907_T0002_550.png)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