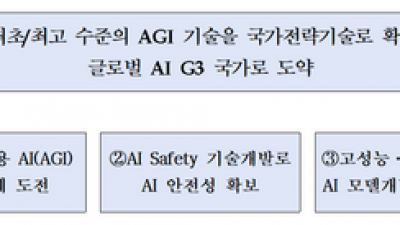“미래 문제는 시기를 놓치면 못 풉니다. 인구 문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닭을 살처분하면서 과거에 몇조씩 낭비했는데 연구개발(R&D)에 지원하고 기술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했어야 합니다. '설마'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연구센터장은 미래 연구와 정책 연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사회의 문제가 되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선 일침을 날렸다. 박 센터장은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가 정권마다 나오고 있지만 정권별 특징이 없다”면서 “이유는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 성장잠재력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를 둘러싼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2030' 보고서를 두고 '양극화 문제를 일찍 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양극화를 이대로 놔두면 생각보다 커질 것이란 시각에서 접근했고 MB정부에서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면서 “그 보고서가 꽤나 선구적인 이유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라는 문제와 현상은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2000년대 초·중반과 현재 2017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는 “외부 동인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고 오래됐지만,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이라면서 “출산을 많이 하게 만드는 정책은 성공을 못한다. 외부 조건을 풀어줘야만 출산을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니까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한번 낳으면 30세까지 키워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출산장려금과 어린이집 지원 등 일시적 지원책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오래된 외부 동인 외에도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의 발달이다. 박 센터장은 “예측은 생존의 문제”라며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데이터 센터가 폭발해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해보면, 정부와 기업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서 “하지만 폭발은 쉽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후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가 바로 '미래 연구'”라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위기, 메르스, 4차 산업혁명 등 외부 충격에도 사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박 센터장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멀리 봐야 하고 전략을 짜서 접근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그런 기관이 많지 않다”면서 “미래 연구는 장기적인 국가 생존과 맞물린 부분으로 장기적 연구를 위한 토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