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공포스러운 기억을 치료할 때 환자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뇌연구원 이석원 뇌질환연구부 선임연구원과 서울대 연구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청각에 대한 공포기억이 소리종류에 따라 뇌에서 다르게 저장되며, 기억을 제거할 때도 각각 맞춤형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번 연구대상에서 공포기억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근원적 공포가 아니라 조건화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을 말한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온라인 전문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4일자에 게재됐다. 이석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논문명은 `청각 공포조건화에서 편도체 가소성의 소리에 따른 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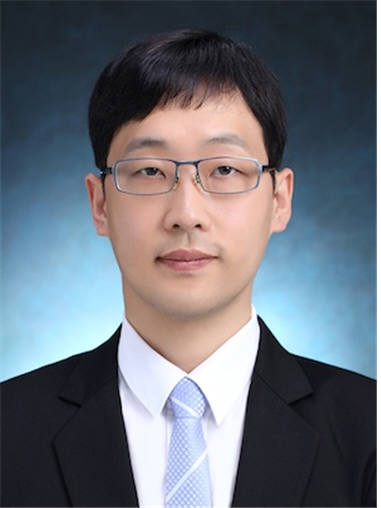
조건화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기억은 뇌에서 `편도체(대뇌 변연계에 존재하는 아몬드 모양의 뇌부위)`라는 부위에 저장된다. 청각에 대한 공포기억 역시 소리 종류에 상관없이 편도체에서 `시냅스 가소성`을 일으키며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된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억이 저장되거나 사라질때 시냅스에 생기는 변화를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공포를 일으키는 소리 종류에 따라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가소성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결과는 공포기억을 제거할때도 소리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순음과 잡음, 변조음 등 3가지 소리를 실험쥐에게 들려줘 공포기억을 만든 뒤 뇌의 편도체를 조사하자 서로 다른 형태의 시냅스 가소성이 나타났다.
시냅스 가소성 현상에 따라 평소에는 적었던 흥분성 신경신호 전달물질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칼슘통과형 AMPA 수용체)가 편도체에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포기억이 만들어지고 6시간이 지난 뒤 실험용 쥐에게 순음을 들려주자 이 수용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잡음과 변조음을 들려줬을 때는 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석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과 같은 질환을 치료할 때 각각의 환자가 겪은 공포자극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공포자극이 편도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냅스 가소성을 일으키는지 밝혀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4대 뇌연구 기반연구사업` 등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