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역사에서 전설로 불리는 기업이 모토로라다. 지난해 구글에 이어 레노버로 인수되는 수모를 당했지만 한때 모토로라는 휴대폰의 대명사였다. 스타텍·레이저 등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며 20년 넘게 시장을 평정했다. ‘휴대폰 레전드’를 꺾은 게 노키아다. 펄프회사였던 노키아는 GSM 붐과 맞물려 98년 모토로라를 제치고 휴대폰 최강자로 올라섰다. 2000년 중반까지 피처폰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절대강자였다. ‘노키아 천하’도 채 20년을 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이듬해인 2012년 권좌에서 물러났다. 당시 노키아CEO는 “불타는 플랫폼에서 뛰어 내리라”며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이를 정점으로 노키아는 시장에서 점차 잊혀가는 신세로 전락했다.
노키아를 무너뜨린 주역이 애플과 삼성전자다. 모두 메인스트림에서 한참 벗어난 ‘아웃사이더’였다. 삼성은 휴대폰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고군분투하는 ‘신참(루키)’ 수준이었고 애플은 통신판에서는 아예 생면부지였다.
2012년 노키아 자리를 이어받은 게 결국 삼성이었다.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 22%로 노키아(19.5%)를 제치고 세계시장 절대 강자로 올라섰다. 애플이 함께 시장을 과점한 이유도 있었지만 ‘14년 노키아 아성’을 무너뜨렸다. 노키아와 점유율이 두 배에 달했지만 이를 2~3년만에 뒤집었다. 가히 휴대폰 역사에 남을만한 기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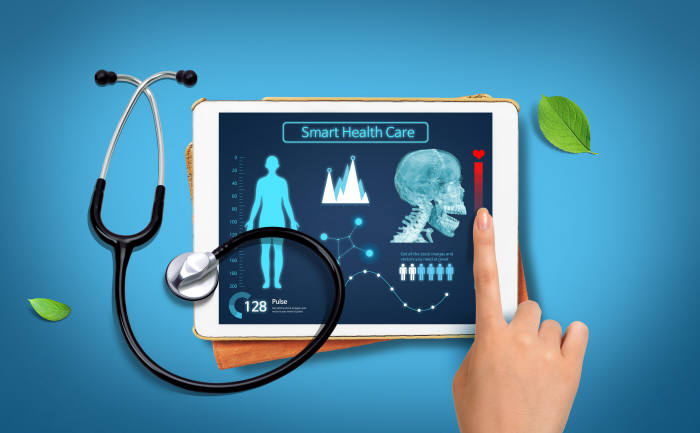
삼성은 여전히 1위다. 그러나 불안한 1등이다. 애플은 여전히 힘겨운 상대이고 샤오미·화웨이와 같이 변방에 있던 중국업체가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스마트폰 시장 전체 수익률 91%를 독점하는 애플도 위기다. 불행히 스마트폰을 대체할 캐시 카우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해법은 결국 비용이다. 제일 먼저 휴대폰 라인업을 줄여야 한다. 삼성은 대략 한해에 250~300개 모델을 출시한다. 이에 따른 ‘오버헤드(Corporate overhead)’가 만만치 않다. 한대 휴대폰을 시험인증 받는데 드는 비용만 대략 20억~25억원 수준이다. 각 나라에서 인증 비용만 6500억원에서 7000억원에 든다는 얘기다. 각 나라 모델별로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서비스 지원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애플처럼 1년에 단 한 모델로 승부하지 못하더라도 절반 이하로 핵심 모델을 집중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폰 성장세는 이미 꼭지를 찍었다. 무엇보다 시장이 변했다. 이미 기술은 보편화됐고 소비자는 더 이상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능 과잉(Over-spec)’에 피로감마저 느낀다. PC시절과 정확히 닮은꼴이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득세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 불고 있는 범용화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가 지적했듯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비용우위, 차별화, 집중화 전략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다. 스마트폰 범용화(Commdity)가 가속화되면 결국 차별화 보다는 비용우위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한 순간 허망하게 무너진 이유를 되새겨 봐야한다. 결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브랜드와 인지도가 떨어져서도 아니었다. 시장, 소비자가 변한다는 걸 애써 무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다.
강병준 통신방송부 데스크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