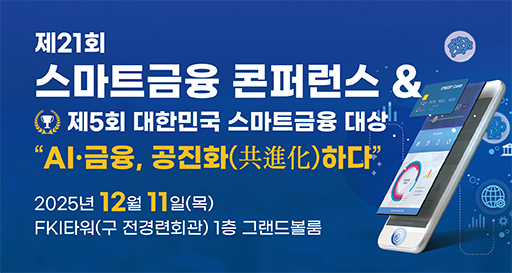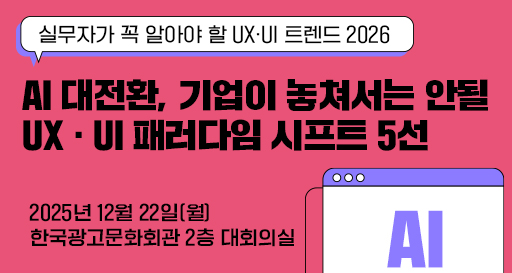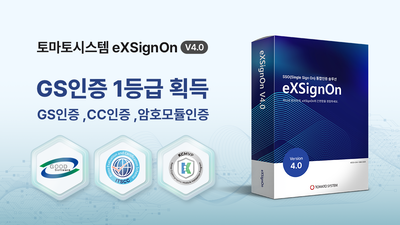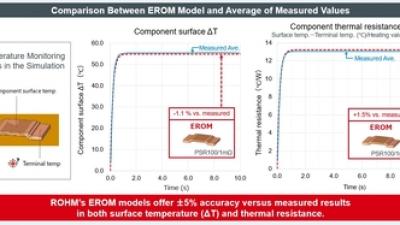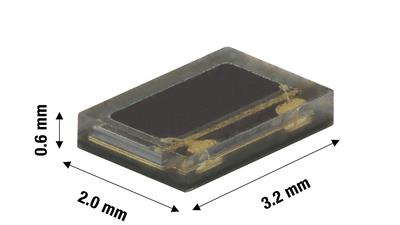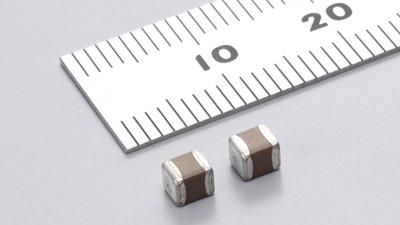국내 방송제작사의 유튜브 서비스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유튜브와 플랫폼 인 플랫폼(PIP) 방식 운영권, 광고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7개 방송 사업자가 유튜브와 결별, 국내 대형 포털로 서비스 플랫폼을 옮겼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한 이용자들이 국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이용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JTBC와 채널A는 8일 한국 내 유튜브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1일 지상파 방송사 에스비에스(SBS), 문화방송(MBC)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일주일만이다. MBN, TV조선, CJ E&M 등은 이르면 9일부터 잇따라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중지할 예정이다.
CJ E&M 관계자는 “당초 지상파 방송사와 동일하게 지난 1일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유튜브와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주일가량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재개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각 방송사업자는 유튜브와 PIP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 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IP는 모바일IPTV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된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 푹처럼 방송사업자가 플랫폼 내 별도 마련된 카테고리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PIP 체계는 온라인 광고 등을 방송사업자가 직접 관리·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PIP 도입 요구를 받아들인 포털 서비스 업체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 국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7개 방송 사업자는 ‘스마트미디어렙(SMR)’ 회원사다. MBC·SBS가 공동출자한 SMR은 온라인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SMR이 국내 포털로 눈을 돌린 것은 그동안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광고 매출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를 상대로 ‘콘텐츠 제값 받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와 국내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익 배분 비율은 45 대 55다. 현재 각 방송사업자와 네이버·다음카카오가 합의한 광고 수익 배분 비율은 90 대 10으로 알려졌다. SMR는 향후 판도라TV, 곰TV 등 중소 인터넷 방송 서비스 업체와 포털과 동일한 조건으로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SMR 7개 회원사가 영상 콘텐츠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유튜브가 향후 PIP, 수익 배분비율 변경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가 한국에서만 별도 사업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시장은 포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유튜브 대체 수단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 사업자가 받는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