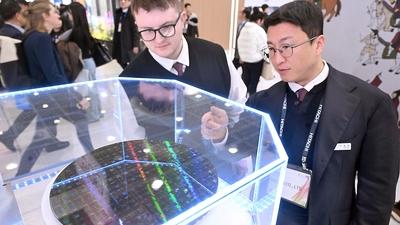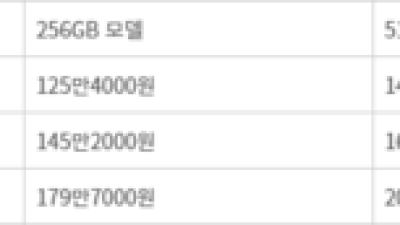1951년 1월이다. 이승만 정부는 중공군 남침에 맞설 ‘국민방위군’을 모았다. 무려 50만 장정이 응했다. 그러나 거센 중공군 공세에 모이자 마자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 칼을 맞아 숨진 게 아니다. 굶거나 얼어 죽었다. 고위 간부들이 피복부터 식량까지 보급품을 착복한 탓이다. 한국전쟁 최대 참사다.
국민 분노가 심상치 않자 이승만 정부는 사단장을 비롯한 비리 혐의자 5명을 서둘러 총살했다. 방위군도 해체했다. 하지만 몸통 없이 깃털만 없앴다. 권력형 비리를 은폐했다.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 지금도 여전한 군 입대 기피 풍조가 혹 이 때 시작한 것은 아닐까.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에 국민 분노가 쏟아졌다. 2억원짜리 성능 미달 음파 탐지기를 40억원에 납품한 통영함 비리는 63년 전 비리와 다를 게 없다. 군수 비리가 방산·군납 비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부는 척결 의지를 밝혔다. 사상 최대 정부합동수사단을 띄우고 감사원도 출동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연루자 대거 처벌만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산은 도입부터 납품까지 온통 기밀이다. 군 출신을 매개로 한 비리 사슬도 견고하다. 이 폐쇄구조부터 깨야 한다. 군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방산 조직을 확 바꿔야 한다. 방산 전문가들이 비리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제대로 대우할 필요도 있다.
방산 비리로 군은 물론이고 방위사업청도 폭탄을 맞았다. 심지어 해체론까지 나왔다. 실제로 방사청 업무 상당 부분을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성급하다. 번지수도 잘못 찾았다.
정부는 2006년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으로 흩어진 방산 업무와 조직을 통합해 방사청을 설립했다. 투명 관리로 비리 여지를 없애고,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최근 잇달은 방산 비리로 이 취지에 큰 흠집이 났다. 그런데 방사청 등장 이후 ‘율곡비리’와 같은 권력형, ‘린다 김 사건’과 같은 로비형 비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 방사청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방위산업이 한창 탄력을 받았다. 삼성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두산DST 등은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강소 방산기업도 부쩍 늘었다. 기업 노력이 컸지만 방사청이라는 단일 협력 창구가 생긴 덕을 많이 봤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방산은 첨단기술 경연장이다. 소재부품,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융합하는 실험실이다. 방산 국산화로 국내 기업에게 열린 이 문이 방사청 조직과 업무 분산으로 다시 닫힐까 두렵다. 기술 이전 없이 강매하는 외국 방산업체 콧대만 더 세질까 걱정이다.
방산·군납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말마따나 이적행위다. 이에 맞춰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비리자 처벌과 방사청 수술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수조원대 권력형, 로비형 비리가 줄고, 수십억원대 실무자 비리가 늘었다면 정보 공개, 문민화, 외부 견제 강화 등 정밀 타격만 잘 해도 곧 방사청을 바로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거의 융단 폭격 수준이다. 그 포음에 국방기술과 산업 발전이라는 방사청 효과와 더 큰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혔다. 비리 몸통을 향해야 할 포가 방사청만 향했다. 사격제원 조정이 절실하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