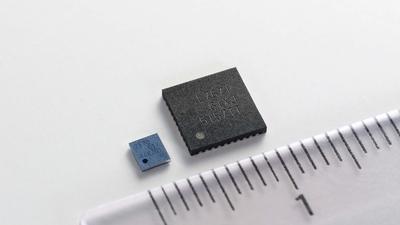공공분야 정보통신공사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복권처럼 운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지만 10년 넘게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업능력이 없어도 사업 수주가 가능해 수주하자마자 수수료를 챙기고 재하도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야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한 뒤 무작위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가리는 ‘적격심사제(속칭 운찰제)’가 10년 넘게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에도 사용되는 이 제도는 실적, 기술자 보유 수, 경영상태 등에서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정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발주 기관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상하 2%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만든다. 가령 100만원짜리 사업이면 98만~102만원 사이에 균등하게 15개 예비가격이 생긴다. 참가업체는 가격은 보지 못하고 이 중 두 개(번호)를 선정하는데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 네 개의 평균가가 최종 예가가 된다.
예가의 87.745%에 해당하는 금액 바로 위로 가장 근접하게 가격을 쓴 업체가 1순위 낙찰자가 된다. 대기업에 유리하던 최저가 입찰제의 병폐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도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뒤따른다.
우선 ‘변별력’이 떨어진다. 사업 규모별로 정해진 특정 기준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 업체는 최소 기준만 간신히 갖춘 곳부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곳까지 다양하다. 발주자는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한 ‘특정 기준’이 이미 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 ‘특정 자격’에 의한 변별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입찰에 평균 40~50곳 정도가 참여하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엔 700여 업체가 참여하는 사례도 많다. 이때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라도 사업 수주 확률은 0.14%에 불과하다.
간혹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 수주 후 중간 이윤만 남기고 하도급을 주는 일도 있어 시장 건전성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 부담스러워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인 정보통신공사 업계 역시 제도의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불만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차별 없이 최소한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적격심사제는 대체가 필요 없는 최고의 제도’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유지되길 바라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발주기관은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단점이 있다”며 “정부나 전문가가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적격심사제의 폐단을 줄이고자 100억원, 300억원 이상 사업에 각각 가격과 사업수행능력, 사회책임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이 방식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