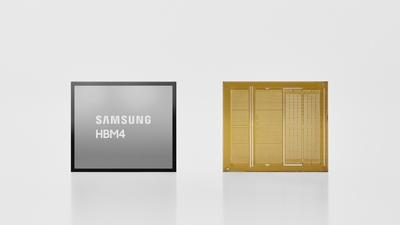망 중립성 논쟁이 통신사업자쪽으로 기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적 효력이 없다며 통신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통신사업자는 망을 과다하게 쓰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업체에 대가를 청구할 근거를 확보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콘텐츠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콘텐츠업체가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명분으로 주창했다. 속내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 투자비 부담 요구 회피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FCC를 움직여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 규제를 만들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엄밀히 말하면 망 중립성보다 FCC 규제 권한이 타격을 받았다. 법원은 정보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공중통신사업자(커먼 캐리어)에나 가능한 규제를 강요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FCC 선택은 다시 소송해 판결을 뒤집거나 ISP를 커먼 캐리어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 다 여의치 않다. 10년 전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바꾼 게 FCC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통신사업자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독려한 결정이다. FCC가 결국 열린 인터넷 규칙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그나마 인정한 `투명한 망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앞서간다. 유·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까지 기간통신사업이다. 정부가 망 중립성 규제 권한을 이미 확보한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엔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을 담은 기준을 내놓았다. 통신사업자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 안으로 제한하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올해 말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작 핵심인 트래픽 투자비용 분담 사안을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접근 방식은 다르다. 망 중립성 일괄 적용을 보류했다. 트래픽 추이, 시장 경쟁을 두루 판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발생 수익 또는 투자비용을 나누는 새로운 망 중립성 해석도 나왔다. 미국 법원 판결까지 더해 망 중립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콘텐츠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수익 분배든, 투자비용 분담이든 쉽지 않은 일이다. 딱 떨어지게 정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있다. 종량제다. 인터넷을 많이 쓴 사용자가 비용을 더 많이 내는 제도다. 문제는 사용자 저항이다. 그런데 콘텐츠사업자가 투자비용을 부담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전가할 게 뻔하다. 그것도 일률적이다. 이럴 바엔 사용량에 따라 적용하는 종량제가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다.
종량제는 이미 부분 도입됐다. 데이터용량 별로 다른 스마트폰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이 요금제를 더 세분화하는 동시에 음성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유선 인터넷도 정액제를 기반으로 일정 데이터 사용량을 넘으면 추가 과금하는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
요금제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시장 상황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다. 사실상 지역별 독점사업자 체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 유선 인터넷 시장은 거의 자유경쟁 체제다. 무선 인터넷엔 와이파이라는 대안까지 있다. 통신사업자가 소비자가 외면할 비싼 요금제를 마구 도입할 수 없다.
망 중립성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공은 통신사업자로 넘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이고 콘텐츠사업자까지 달랠 요금제 해법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정부가 요금 규제라도 누그러뜨리면 묘안 찾기가 한결 쉬워진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