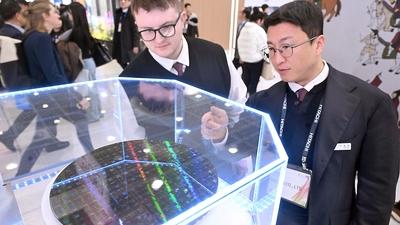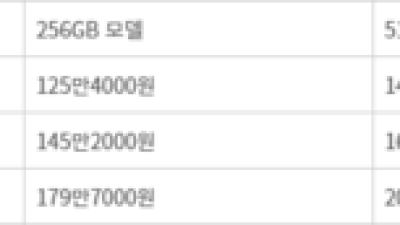손목에 차고, 안경처럼 쓰는 스마트 기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반길까. 착용(웨어러블) 이유를 더 체감할 헬스케어는 어떤 것이 나올까. 강하면 부러질까봐 화면이 휜 스마트폰과 TV가 소비욕구를 과연 건드릴까. 온 곳에 퍼지는 센서네트워크, 가전·통신업체뿐만 아니라 보안, 생활용품유통업체까지 뛰어든 홈네트워킹 미래는 어떻게 될까. 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CES 2014`에 이런 것이 궁금하다.
삼성전자는 어느덧 최대 관심 기업이 됐다. 새 혁신을 내놓지 않을지라도 1년 전 이 자리에서 선보인 스마트폰 혁신을 실물로 보여준다면 `애플 없는 곳에서만 주인공`이라는 비아냥거림을 걷어찰 수 있다. 삼성만큼 독일 자동차 회사 아우디에도 눈길이 간다. 루퍼트 슈테들러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을 한다. 인텔, 소니, 야후, 시스코 CEO보다 이 사람이 제시할 기술 미래가 더 솔깃하다. 그만큼 자동차와 전자정보통신 기술 융합이 성큼 다가왔다.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자동차 회사는 이미 전자정보통신기술 전시회 단골이 됐다. 이번 CES에 유독 많다. 벤츠, 아우디, BMW, 도요타, 현대·기아차, GM, 포드 등 세계 정상 기업이 다 나왔다. 부품업체까지 600개사가 나온다니 다음 주 열릴 디트로이트모터쇼를 걱정할 판이다. 인포테인먼트, 스마트기기 연동은 물론이고 무선 충전, 자동 주차, 자율 주행까지 기술적 한계도 사라졌다. 자동차산업 미래가 전자정보통신기술을 만나 이렇게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다. 세계 1위 철강 회사도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스마트폰, 배터리 등이 세계 일등인 전자 강국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세계 최고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 자원이 풍부하다.
정작 기업 간 교류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산업을 떠받친 자동차와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미래가 바로 둘의 융합에 있는데 서로 데면데면하다. 마케팅 제휴는 있어도 연구개발(R&D) 협력은 없다. 차량용반도체를 빼곤 변변한 국책 R&D 과제도 없다.
이런 불안감이, 특히 자동차 기업에 작용할지 모른다.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런데 이상하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업체보다 구글, 애플과의 협력에 더 적극적이다. 미래 자동차 시장을 통째로 넘보는 두 회사다. 자동차 회사들이 운영체제(OS) 시장을 주도하는 이들과 어쩔 수 없이 협력할지라도 위험 분산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기아차가 OS 외의 기술 협력까지 국내에서 소극적인 것은 더 이상하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만 해도 일본산을 더 쓴다.
혹시 재계 라이벌 의식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처구니없다. 현대, 삼성, LG, SK의 재계 자존심 경쟁은 세계와 미래 시장에선 아무짝에 쓸모없다. 더욱이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미래를 위해 심지어 경쟁사와 손을 잡는 시대다.
외국기업과 담을 쌓고 국내 기업끼리 협력하라는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다만, 있는 강점을 살려 협력하라는 얘기다. 그래야 미래 경쟁력을 더 빨리 키운다.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분야 협력사도 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 관련 정책이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로 흩어졌다. 기존 업무 영역 외엔 미래 기술 융합을 생각하지 않는다. 업체 역량을 모으려면 부처 협력이 절실하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 내년 혹은 이듬해라도 현대·기아차 CEO가 CES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가 삼성이나 LG CEO를 불러들여 새 혁신을 소개한다면 더욱 짜릿한 장면이 될 것이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