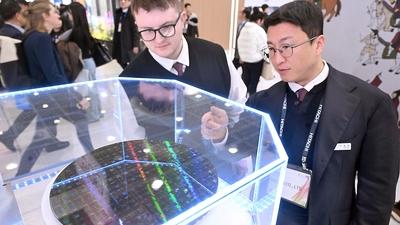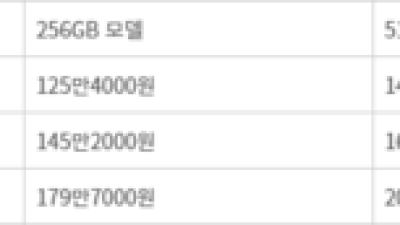한국 제조업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LG경제원구원은 지난해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5.1%로 1960년 이래 가장 낮으며, 심지어 미국에 역전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수출 역량이 미국, 일본에 여전히 뒤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이 우리 뒤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이 고작 0.1%로 13년만에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모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임을 걱정한다. 어쩌면 이미 돌입했을지 모른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빼면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쫙 빠지는 상황이다.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제 끝났어. 우리도 선진국처럼 금융과 서비스산업으로 가야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정말 그런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의 경제 비중이 2011년 31%로 독일(23%), 일본(19%), 미국(13%)보다 높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4위다. 누가 뭐라 해도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아무리 위기라 해도 포기하고 갈 수 없다.
위기 진앙은 중국이다. 하지만 새삼스럽지 않으니 독립변수조차 안 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은 중국 기업의 성장과 상관없이 아직 건재하다. 아무리 가격경쟁력으로 도전해도 하기에 따라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 최하위라고 하나 제조업의 경우 2위다. 통상임금, 경직된 노사문제가 큰 걸림돌이나 기업이 아닌 사회가 풀 문제다.
제조업 위기는 새 부가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제조업체 경영자가 늘 고민하는 주제다. 조금 더 노력하면 해외 경쟁사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 책을 읽고, 이런저런 모임에 가 봐도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국책 프로젝트로 돕는 나라가 하나 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다.
탄탄한 제조업 덕분에 경제 위기를 넘긴 독일도 그 미래를 걱정한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산업 4.0`(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다. 증기기관(18세기 말)→전력·대량생산(20세기 초)→전자·정보기술(IT)·자동화(70년대 이후)를 이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핵심은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센서네트워크부터 기업용 소프트웨어, 위치정보, 보안,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 증강현실까지 온갖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혁신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다. 제조업체는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과정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 제품과 사업 기회를 찾는다. ICT업체는 신규 수요 창출과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을 다진다. 제조업 중요성을 새삼 절감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모두 이 프로젝트를 주목한다.
그 어느 나라보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좋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독일 제조업 구조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분야는 달라도 독일처럼 세계 일등인 제조산업이 많다. ICT 인프라는 훨씬 뛰어나다. 관련 기업도 꽤 있고, 국책 연구 인프라도 갖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차세대 ICT 개발, 융·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을 편다. 아쉽게도 단절됐다. 스마트팩토리와 같이 하나로 관통하며 제조업과 ICT산업을 함께 키우는 국책 프로젝트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에 애를 쓴다. 그런데 너무 먼 곳만 본다. 가까이에서 큰 돈 안 들이고도 구체화할 길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래저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제조업이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