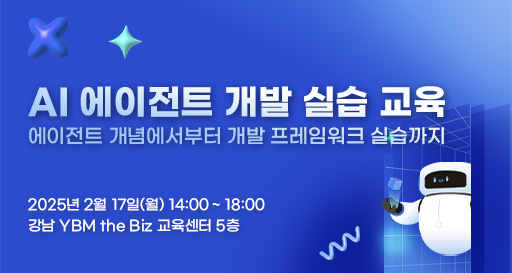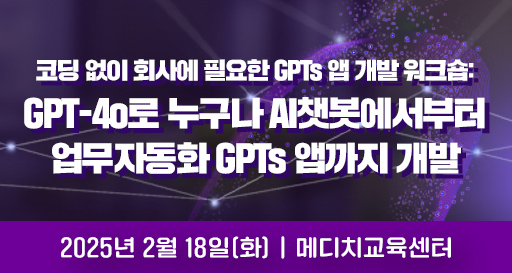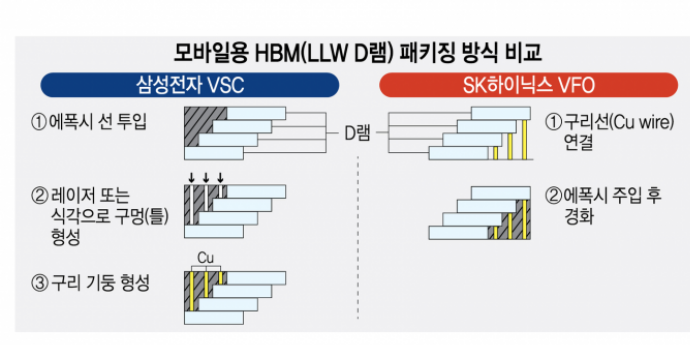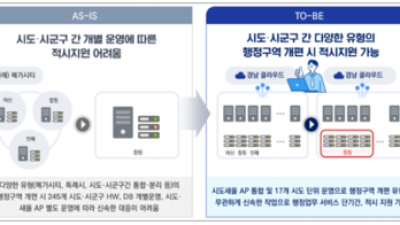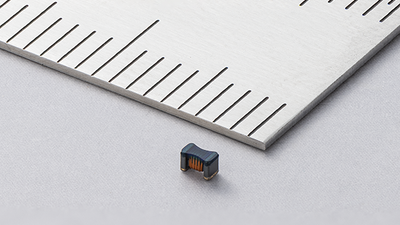사상 최대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고 세계시장 점유율 등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 성과를 발표할 때면 줄곧 `최대` 또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동원됐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무역역조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아`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경제를 이끄는 `효자`로 탈바꿈해 자랑거리로 회자된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사상 최대`가 있다. 대(對)중국 소재부품 수입이 그것이다. 한 수 아래로 취급했던 중국 소재부품은 이미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재부품 수입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본 소재부품 무역 역조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왜 줄어들지 않는지, 후발국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려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소재부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신뢰성(Reliability)`이다. 신뢰성이란 공학 용어로 소재부품의 초기 품질이 목표 수명 기간 동안 얼마나 만족스럽게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쟁자가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장기적 관점의 경쟁력이다.
우리는 지난 2010년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를 잘 기억하고 있다. 세계 품질 1등 도요타의 명성이 한순간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다. 다양한 분석이 있겠으나 가격과 신뢰성 간 균형 상실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도요타는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 소재부품 유혹에 빠졌다. 결국 잦은 고장과 대량 리콜을 유발해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신뢰성 문제로 타격을 입은 사례는 너무나 많다. KTX의 반복되는 고장도 부품 신뢰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결책을 잘못 찾는 과오를 범한다. 문제 부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그저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식의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정부는 `2020년 소재부품 글로벌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발표하고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신뢰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 신뢰성 확보는 제품에 클레임이 걸린 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니다. 개발·양산 과정에서 자발적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신뢰성 확보의 실패, 성공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신뢰성 수준을 비교 발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둘째, 국가 연구개발(R&D) 전 분야에 신뢰성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 R&D 성공률이 높음에도 사업화가 안 되는 이유는 양산을 위한 제품 수명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데 있다. 신뢰성 검증체계 도입은 R&D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분야 신뢰성 기반을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우리의 최첨단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 글로벌 표준 선점 등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의 경쟁력인 신뢰성 확보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민관이 함께 노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소재부품 세계 4대 강국이라는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박상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장 psy426@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