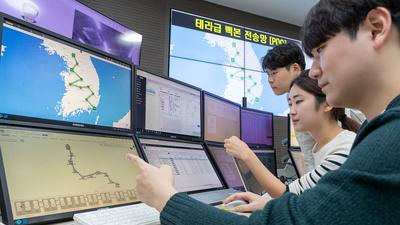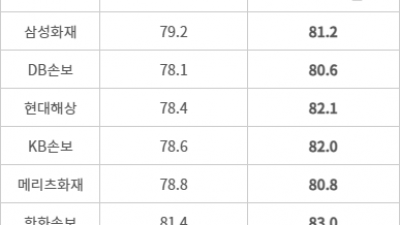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에 개입하는 지능형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공식적 움직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발전과 보급 촉진을 위해선 선제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지능형 자동차를 넘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능형 자동차란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차량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선 이를 0단계(완전 유인)에서부터 4단계(완전 무인자율)까지 세분화했다. 도요타와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보쉬, 콘티넨털 등 주요 완성차 업체 및 부품사가 2020년을 전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 등 IT 업체도 자율주행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는 과도기적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8월 출시된 현대차 뉴 아반떼에 적용된 `주차조향보조시스템(SPAS)`이 대표적이다. 변속과 브레이크 작동은 운전자가 해야 하지만 운전대가 자동으로 움직인다. 현대차가 연말 출시하는 뉴 제네시스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판단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자동 위험감지 브레이크(AEB)` 시스템이 적용된다.
문제는 지능형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SPAS는 운전자가 개입하긴 하지만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분쟁 소지가 있다. AEB도 오작동으로 사고가 나면 현 제도 하에서 오작동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 차가 한 일을 무조건 운전자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지 물음이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조사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선 지능형 자동차 관련 제도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 논의가 전혀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이 세미나나 포럼 등에서 개인 자격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해외에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웃 일본에선 지난해 국토교통성이 앞장 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 전용 차선을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표준 및 법률, 인프라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UN 산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도 지능형 자동차와 제도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지능형 자동차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표준 개정 및 제정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