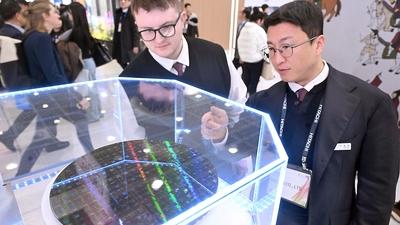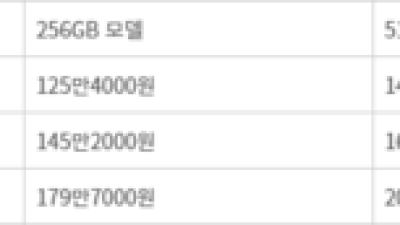“전 요즘 `민족`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무너진 농촌을 외국 여성이 지키잖아요. 우리 사회도 변화를 수용해야죠.” 최근 만난 한 고위 관료의 말이다. 그의 말마따나 우리나라도 어느새 다문화·다인종 국가 면모를 갖췄다.
지난 6월에 체류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었다. 100명 가운데 세 명꼴이다. 2020년께 5%, 2040년께 10%로 높아진다고 한다. 자녀까지 포함하면 더해진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떼놓은 정부 정책을 버릴 때가 가까워졌다.
이주 외국인은 대부분 아시안계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많다. 중국 국적이 많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 출신이 느는 추세다. 이들을 향한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뺏는다고 비난한다. 결혼이민자에게는 단일민족 문화 훼손 운운한다. 배타적이고 이중적이다.
식당부터 생산라인까지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적게 받는다. 이들 덕분에 이른바 3D 제조기업들은 인력난을 덜고 경쟁력을 유지한다. 결혼이민자는 나이든 농촌총각의 배우자가 많다. 아기 울음소리 사라진 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공로에 사회의 평가는 너무 인색하다.
세상에 `단일민족`이란 없다. 교류와 이동 속에 인종과 종족은 늘 섞이게 마련이다. 민족이란 개념도 근대에 나온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땅도 상고시대 이래 쭉 다문화·다종족 시대였다. 조선 쇄국 때 잠시 흐름이 끊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한다. 개념뿐이면 나으련만 외국인, 특히 아시안을 향한 혐오와 차별로 나타나니 문제다.
길게 돌아왔다. 다문화 사회 문제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기술산업계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때라고 말하고자 함이다.
우리 기술산업계가 이룬 성공은 눈부시다. 짧은 기간에 독일, 일본에 못지않은 세계 일류 기술 제조국 반열에 올랐다. 스스로 이룬 성과라 자부심이 더하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하드웨어산업은 퇴보를 걱정할 지경이다. 소프트웨어 파워는 여전히 약하며 발전 속도는 더디다. 획기적 돌파구가 필요하다. 문득 아시안이 떠오른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아시안 엔지니어다.
우리 기술산업 출발점에 유학생이 있었다. 선진국에서 배운 기술을 귀국하면서 전파해 실마리를 풀었다. 이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나 예전 같지 않다. 애국심에 기댈 때도 지났다.
국내에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거꾸로 간다. 기술자가 되겠다는 젊은이가 드물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문기술자 일도 초급 인건비로 산정하는 풍토에 3D산업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세계 기술 발전으로 이끌었다. 이곳을 토종 미국인이 아닌 유태계, 지금은 중국과 인도계 엔지니어가 움직인다. 다른 아시안계도 는다. 우리는 늘 G밸리나 대덕을 실리콘밸리처럼 만드는 꿈을 꾼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외국인은 없다. 국가 기술 연구개발 전략 역시 국수주의 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코딩과 같은 단순 기술직이라면 데려올 아시안이 넘쳐난다. 인재라면 비용은 둘째 치고 영입 자체가 힘들다. 외국인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꾼다면 훨씬 쉽고 비용도 적어질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외국인 기술 창업과 취업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왕 하는 김에 더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한다. 그래야 영화 `방가방가`와 `완득이` 속 인물에 드리워진 슬픔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뀐다. 편견으로 인해 외부를 향해 닫힌 우리 사회도 더 열린다. 이주 외국인과 자녀가 저소득 하위 계층만 두텁게 하는 사회 문제도 미리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