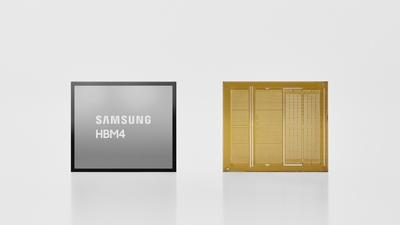며칠 전 한 전직 고위 관료가 보내온 메일에 있던 말이다. 그는 관료 시절에 듣던 이 말을 요즘도 후배로부터 듣는다며 경직된 관료 사회를 점잖게 꾸짖었다. 정말 바꾸기 힘든 공직 사회다.

말 자체는 그릇되지 않다. 법규를 어긴 행정을 해선 곤란하다. 예산도 없이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감사에 걸릴 일은 더더욱 삼갈 일이다. 어쩌면 관료로서 당연한 행동이나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보다 관료 생명 유지에 더 치우쳤다는 게 문제다. 이른바 복지부동이요,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요즘 4대강 사기극 논란을 보면 더욱 와 닿는 말이다. 감사원은 대운하 사업의 위장임을 밝혀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도 거짓 해명과 사실 은폐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지니 다행이다. 그런데 그 당시 당사자가, 그것도 때늦게 실토했다. 메시지는 딱 하나다.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창조경제를 비롯해 지금 내놓는 정책도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뒤집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기찬 노릇이다.
공무원들은 권력 뜻을 거슬렀다가 좌천되거나 관료 생명이 끝나는 것을 오랫동안 봐 온 사람들이다. 충분하지 않은 보수에 승진과 정년퇴직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은 다르다. 관료들이 존재이유마저 깡그리 잊은 것까지 동의해줄 수 없다.
그냥 월급쟁이나 하라고 녹봉을 주는 게 아닌데 소신도, 정책 의지도 없다. 아무리 권력이 요구해도 아닌 것엔 아니라고 말하며, 설령 요구가 없어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과감히 추진하는 공무원을 납세자는 원한다. 이럴 뜻이 전혀 없는 보신주의자들이나 규정과 예산, 감사를 따진다. 이것만큼 좋은 은폐, 엄폐 수단이 없다.
규정과 예산이 없으면 왜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가.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데 감사가 두렵다면 왜 감사를 현실에 맞게 바꾸려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조차 일일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박근혜정부 들어 정치 색깔과 상관없이 호응을 받은 말이 있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와 ‘네거티브 규제’다. 앞은 창의적인 도전이 활발한, 뒤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손톱 밑 가시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슬로건이다. 정작 두 슬로건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공직사회다.
책상머리에 앉아 짜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창의적인 발상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든 정책이 애초 의도와 달리 가면 곧바로 수정해야 한다. 규정에 없는 일은 해선 안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개선의 여지가 많은 도전감으로 여겨야 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좋은 평가를 받기는커녕 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만 높다. 정책 실패를 알면서도 비판이 두려워 쉬쉬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어디 한 두 가지인가. 예산이 남으면 그 다음해에 더 많이 쓰면 될 텐데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으면서 소진한다. 당장 시행할 것처럼 잇따라 내놓는 산업 육성 정책도 그렇다. 실제론 이맘때부터 시작,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따도 일러야 내년 혹은 그 이듬해에 집행할 일이 다반사다.
박근혜정부는 새 정부 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을 말한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 국정과제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일자리와 창조경제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이다. 정작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관료를 양성할 계획이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 3.0’이 아직 허울 좋은 구상에 머무는 이유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