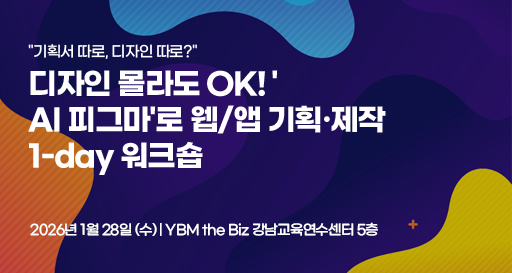최근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고 있다. 독과점처럼 대형 맥주 메이커가 나눠 가졌던 시장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언론 보도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몇 달째 논란이 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 맥주가 출품작 절반에 상을 주는 외국 맥주 시상식에 참가해 상을 받은 것을 두고 `한국 맥주의 맛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 것을 두고 비판 글도 올라온다. 맥주 맛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주세법 개정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맛있는 맥주 논란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도대체 맥주가 뭐 길래?

맥주의 주원료가 보리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맥주는 보리의 싹을 틔워 맥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맥아는 보리에서 전분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몰트(malt), 엿기름 등으로 불린다. 재래시장이나 방앗간 등에서 파는 엿기름은 엿이나 식혜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인다. 또 보리 맥아에 밀·옥수수 등을 첨가해 독특한 맥주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아는 발효되기 좋은 단당류인 맥아즙으로 추출되고 여기에 홉(hop)을 넣는다. 홉은 맥주의 쓴 맛과 향을 더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후 맥아즙에 효모를 넣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효모가 맥아즙 당분을 분해하면서 번식하는 셈이다. 발효과정에서 효모와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라거 맥주(하면발효 맥주)와 에일 맥주(상면발효 맥주) 두 가지로 나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목 넘김이 짜릿하고 맛이 깔끔한 라거 맥주는 4~10도의 낮은 온도에서 6~10일간 발효시킨다. 에일 맥주는 16~21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3~6일정도 발효시킨다.
전통적인 맥주 제조 방법은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발효시킨 상면발효 방식이다. 맥주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영국과 `맥주순수령`을 발표했던 독일 등지에서는 단연코 에일 맥주가 인기다. 투명한 구릿빛의 풍부한 향이 장점인 `런던프라이드`는 물론이고 짙은 초콜릿색에 고소한 거품을 자랑하는 아일랜드 흑맥주인 `기네스`도 에일 맥주 종류에 들어간다. 또 지방마다 고유한 맥주를 자랑하는 독일의 쾰슈나 바이젠(밀맥주) 등도 상면발효 방식으로 제조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저온 저장 방식이 발달하면서 나온 라거 맥주는 쓴 맛이 적고 음식과 함께 마시기에 좋아 좀 더 대중적이다. 가볍고 탄산기가 강한 네덜란드 대표 맥주 `하이네켄`이나 부드러운 거품이 인상적인 일본 `아사히`, 그리고 한국의 `카스`나 `하이트` 맥주도 대부분 라거 맥주다.
한국 맥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마이크로 브루어리(Micro Brewery:소규모 양조장) 열풍을 이끄는 것도 바로 에일 맥주와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수제 맥주)`다. 와인 종류가 이루 셀 수 없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되는 크래프트 비어의 맛도 제조자 레시피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대 초반 크래프트 비어는 가게에서 직접 제조한 `하우스 맥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맥주 제조 관련 규제가 강력해 매장 내에서만 맥주를 파는 게 가능했다.
2010년 정부가 국내 중소규모 주류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소규모 맥주제조업제조시설 규모제한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국내 맥주 시장에도 물꼬가 트였다. 이듬해 광복 이후 첫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획득한(OB맥주와 하이트진로는 1933년 일제강점기 시절 맥주 제조 면허를 취득했다) 세븐브로이는 국내 최초의 중소형 맥주 기업으로 `크래프트 비어` 보급에 나섰다. 김경삼 세븐브로이 대표는 하우스 맥주점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대기업이 장악한 맥주 제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맥주 주원료인 깨끗한 물을 찾아 강원도 횡성에 맥주공장을 차렸다.
세븐브로이는 일반인들에게 낯선 인디아페일에일(IPA)을 대표 맥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 중이다. 감귤, 견과류 등 풍부한 향과 쌉쌀한 맛이 어우러진 크래프트 비어의 대표선수 격인 IPA의 탄생에는 독특한 배경이 있다. 영국이 19세기 식민지인 인도까지 맥주를 변질 없이 보내기 위해 다량의 홉을 넣은 데서 출발했다. IPA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크로 브루어리를 중심으로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사랑받게 된다.
크래프트 비어는 현재는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홍대, 강남 등지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세븐브로이에 이어 카브루도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따서 크래프트 비어 전문 제조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카브루는 펍(Pub)이나 레스토랑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세븐브로이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자신들의 레시피로 맥주를 제조해주기도 하고, 계약을 맺고 위탁 생산을 해주기도 한다. 이태원의 유명 펍으로 알려진 `맥파이`나 `크래프트웍스` 등이 카브루에 맥주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다. 크래프트웍스는 `설악(흑맥주)` `백두산(밀맥주)` `지리산(IPA)` 등 독특한 작명으로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마이크로 브루어리와 크래프트 비어 열풍은 더 이상 시장의 변화가 대기업이 이끄는 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는 다양해졌다. 집 앞 대형마트에만 가도 세계 맥주를 저렴하게 묶음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소비자는 직접 원하는 맥주를 찾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까지 하면서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폭탄주`로 대표되는 한국의 왜곡된 술 문화가 음식의 맛과 향을 즐기는 자리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기도 하다.
여름은 맥주의 계절이다.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목을 적시는 짜릿한 황금빛 탄산과 부드러운 거품 생각이 간절해진다. 맥주는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와인과 달리 일반인에게 친근한 술이기도 하다. 기록에 따르면 인류는 기원전 빵을 만들어 먹을 때부터 맥주를 마셔왔다. 더운 여름 퇴근길 회사 앞 호프집에서 동료들과 즐기는 생맥주 한 잔도 좋고, 동네 친구와 가게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캔 맥주도 좋다. 일단, 한잔 마시고 다시 이야기하자.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