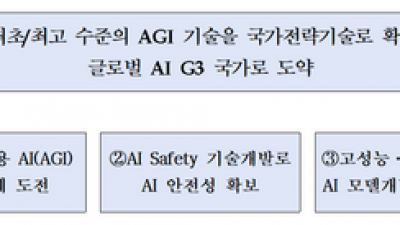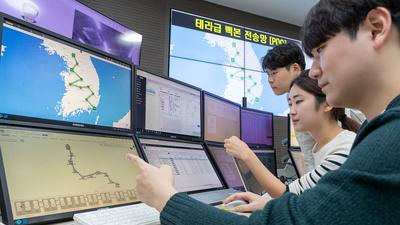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계적 대결로 기업 간 특허침해소송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 줄 것인지 관심 가질 정도다. 기업 간 특허분쟁은 산업계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편이다.

특허침해소송은 일반적으로 상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제기한다. 30여년 전만에도 국내 산업계에는 `카피`가 유행했다. 미국이나 유럽·일본 등 선진국 기업의 제품 설계도를 참고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싼 값에 판매했다. 요즘 모방제품으로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30여 년 전의 딱 우리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선진 기업은 기술이나 제품을 카피한 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소송을 걸어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최근엔 글로벌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 무턱대고 제품이나 기술을 베끼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특허침해소송 건수가 늘어나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특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소송을 당하면 영업활동은 올 스톱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다. 더군다나 특허분쟁은 한 번 시작하면 몇 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체력으로는 버텨내기 힘들다. 중소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회피·길목 특허를 개발해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특허분쟁을 겪은 중소기업인 이라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고민이 있다. 특허분쟁 조기 해결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특허법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특허법원은 1998년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설치할 당시만 해도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모두를 관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법체계상 문제로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만 관할하고 특허침해소송은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에서 처리해 왔다. 이후 이 같은 이원화 체제는 전문성과 신속성,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하나는 변리사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적인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변리사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법을 고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필요하면 변리사에게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전담 변호사를 육성해서 특허분쟁에 임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몇 년에 걸친 지루한 특허분쟁으로 탈진한 중소기업에 특허분쟁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큼 약이 되는 것은 없다. 특허분쟁을 단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특허법원 강화와 전문성 갖춘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문정 논설위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