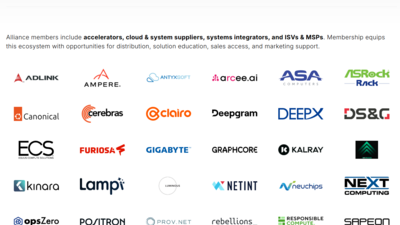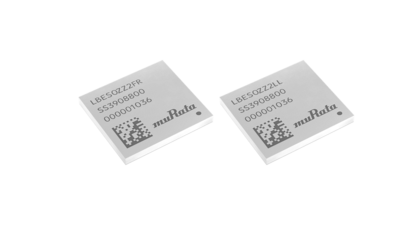자동차 바퀴에 고무를 쓰기 시작한 건 1860년대부터다. 나무나 쇠 바퀴는 잘 망가져서 탄성이 있는 고무를 둘러서 썼고, 이후 진화를 거듭해 우리가 쓰는 바람 넣는 타이어로 이어졌다. 요즘엔 용도별로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한다. 신소재가 적용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내 차와 도로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최초의 공기압 타이어는 1888년 영국 수의사인 존 보이드 던롭(John Boyd Dunlop)에 의해 태어났다. 고무판으로 호스를 만들어 나무 바퀴에 붙이고, 지면과 닿는 부분은 두꺼운 캔버스지로 감싼 타이어를 세 발 자전거에 장착해 달린 게 시초다.
1891년 CK 웰치(CK Welch)가 비드 와이어 타이어를 개발했고, 1891년 미쉐린 형제도 손 힘 만으로 뗄 수 있는 타이어 특허를 냈다. 1904년엔 파이어스톤(Firestone)과 굿이어(GoodYear)가 스트레트 사이드 와이어 비드 타이어를 개발하는 등 대부분이 이러한 제조기법을 사용하기에 이른다.
1928년부터는 타이어 강성을 좌우하는 코드지 개발이 한창이다. 열에 약한 면 코드지를 대체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레이온을 썼으며, 1948년부턴 나일론 코드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1962년엔 폴리에스터 코드지가 등장했다. 1970년대 들어 강철선인 스틸 코드가 등장하며 대세로 떠올랐다. 1972년 듀퐁이 `케블라`라는 철보다 5배 강한 폴리아미드계 소재를 만들었다. 그러나 값이 비싸 일부 제품에만 적용됐었다.
1980년대엔 자동차 성능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레이싱카에 쓰는 `슬릭 타이어(Slick Tire)`도 이 당시에 개발됐다. 아울러 차종이 다변화됨에 따라 여러 규격과 많은 용도의 타이어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엔 바람을 넣지 않아도 되는 비공압식 타이어도 등장했다. 한 가지 소재로 만들어 재활용이 쉽고, 바람을 넣지 않으니 `펑크` 날 일도 없다.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최근엔 친환경차에 적용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초창기엔 타이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집중했다면, 요즘엔 신소재와 타이어 패턴 개발에 경쟁이 치열하다. 제품군도 다양해져서 웬만한 승용차보다 큰 특수 타이어도 개발됐고, 시속 400㎞를 달려도 끄떡없는 초고성능 제품까지 나왔다. 까만 고무로만 인식되던 타이어. 앞으론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하다.
박찬규기자 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