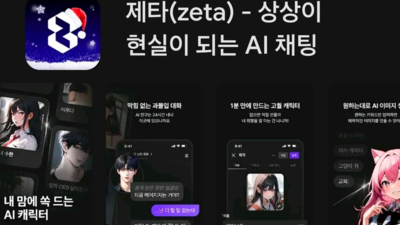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조직 개편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막바지 세부 밑그림을 놓고 해당 정부부처는 물론 덩달아 산업계도 좌불안석이다. 쪼개지고 합해지는 미래부 역할과 기능에 따라 메가톤급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크게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두 부문이 핵심이다. 전담 차관제를 도입해 1차관이 과학기술을, 2차관이 ICT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차관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이전 교과부와 지경부 R&D업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과 조정 업무를 도맡는다. 2차관 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뿔뿔히 흩어졌던 지경부·행안부·문화부 일부 IT업무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만 놓고 보면 과기부와 정통부를 합친 조직 이상이다. 가히 `공룡부처`로 불릴만 하다. 일부에서는 특정 부처에 힘과 권한이 쏠린다며 거대 부처의 폐해를 우려한다. 기우에 불과하다. 덩치는 부처개편 논의에서 핵심이 아니다. 커진 만큼 성과를 내면 그만이다. 역할과 기능만큼 분명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 비대한 규모가 무서워 정작 필요한 기능을 뺀다면 죽도 밥도 아닌 `반쪽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 단지 이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는 게 급선무다.
미래부의 가장 큰 임무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다.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지만 아마도 과학기술 쪽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ICT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 업무가 될 듯하다.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빼 놓을 수 없다. 인력과 연구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은 지대하다. 대학이 과기·연구계의 기초기술과 산업계 응용기술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ICT도 마찬가지다. ICT산업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지난 정부에서 ICT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데는 콘텐츠에서 단말까지 제각각 사분오열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능은 서로 합쳐져야 의미가 크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ICT가 만나 확실한 시너지를 내야한다. 두 분야가 컨버전스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래부는 교과부·지경부·방통위 국과위 등 각 부처의 R&D와 ICT 분야를 물리적으로 합친 구조다. 여기에 다시 1, 2차관 형태로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 놨다. 한 부처로 모았지만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래선 통합 의미가 없다. 첨단기술과 인프라 산업을 모아놨다고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과학과 ICT를 합쳐는 지를 국민에게 피부로 보여줘야 한다. 단순한 조합이 아닌 새로운 판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도 시너지를 보여줄 수 없다면, 쪼개는 게 오히려 상수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