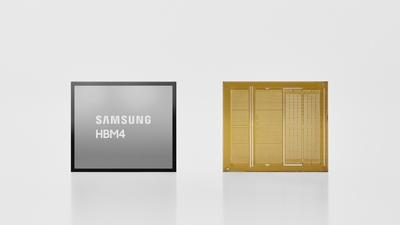깜짝 놀랐다.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발표했을 때다. 한때 소문이 돌기는 했어도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업종, 비중, 나라는 다르나 모토로라의 휴대폰 사업, HP의 PC사업 매각을 떠올리게 한다. 그 정도로 웅진코웨이는 그룹의 주력 사업이다. 웅진 그 자체다.
웅진엔 혹독한 겨울나기다. 지난 5년간 공격적인 기업 인수와 신규 사업 확장의 후유증에 시달린다. 지난 2006년 웅진에너지 설립, 이듬해 극동건설과 2008년 새한(현 웅진케미칼) 인수, 그리고 웅진폴리실리콘 설립까지 숨가쁘게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10년엔 서울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건설, 태양광 에너지, 금융 사업으로 그룹 외형을 키우고 새 성장동력을 삼겠다는 복안이다.
IMF 이후 너무 잘나간 것에 대한 시샘인가. 불운은 따로 오지 않았다. 악재를 한꺼번에 만났다. 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태양광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과당 경쟁으로, 금융은 저축은행 정권 비리 사태 여파로 고전한다. 그룹 매출 25%를 차지하며, 영업이익률이 15%를 넘는 웅진코웨이를 팔기로 한 것은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 지 보여준다.
웅진코웨이는 재무구조도 탄탄하지만 방문판매 조직이란 막강한 유통망을 보유했다. 통신을 비롯한 대기업이 이 회사와 손을 잡고 싶어 한 바로 그 이유다. 탐을 내는 기업이 워낙 많으니 매각은 무난할 것이다. 웅진은 이를 통해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사업 구조를 탈바꿈하려 한다. 쉬운 일은 아니나 잘 돼야 한다. 웅진의 상징성은 그만큼 크다.
윤석금 웅진 회장은 자본금 7000만원의 출판사로 시작했다. 30년 만에 매출 6조원의 30대 그룹을 일궜다. 기존 재벌과 달리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다 할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 대기업의 끊임없는 견제를 이겨냈다. 오로지 스스로 맷집과 몸집을 키웠다. IMF 한파도 적절한 구조조정과 함께 `정수기 렌털`이란 창의적인 발상으로 극복했다.
무엇보다 한 젊은 백과사전 영업사원이 쓴 성공 신화다. 재벌이 지배한 우리 기업 풍토에서 매우 드물다. 젊음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기득권에 도전한 시도는 거의 실패했다. 70년대를 풍미한 율산, 제세그룹이, 2000년 벤처 열풍을 일으킨 벤처 창업가가 그랬다. 웅진이 몰락하면 윤 회장의 강연을 듣고, 책을 읽으며 정직한 성공과 도전을 꿈꾼 많은 젊은 창업가가 좌절한다.
웅진이 핵심 계열사를 내놓자 그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데 당시 글로벌 경제 위기 낌새도 전혀 없던 때다. 태양광 시장 전망도 `장밋빛`이었다. 윤 회장이 그룹을 빨리 키우고 싶은 욕심과 지나친 자신감에 따른 오만으로 위험 경고를 무시했을 수도 있다. 내부 의사결정 구조 문제일 수도 있다. 만일 그랬다면 이제라도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생때같은 웅진코웨이를 팔겠다는 게 그 신호라고 믿고 싶다.
윤 회장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창의`와 `열정`이다. 그 밑엔 `긍정`의 힘에 대한 믿음이 흐른다. 그는 2009년에 낸 자서전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에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열정을 다짐한다고 한다. 그가 성공 기업인이 아니었다 해도 이러한 긍정적 사고는 좌절할 게 너무 많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더 절실하다.
윤 회장은 박병엽 팬택 부회장과 함께 재벌 틈바구니에서 성공신화를 만든 `아이콘`이다. 때 마침 박 부회장이 오랜 시련과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어려울 때 더 힘이 솟는다는 윤 회장이다. 그의 긍정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흘러넘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