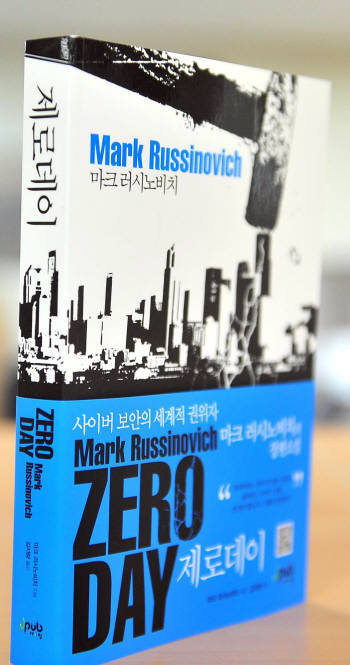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는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제조기로 통하는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과 배우 윌 스미스가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80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결과, 1996년 상영 당시 8억1120만 달러라는 엄청난 흥행 수입을 거둬들였다.
투입 제작비 10배 이상을 거둬들였지만 인디펜던스데이는 엉성한 내용 때문에 두고두고 세간의 조롱에 시달렸다. 그 가운데 압권은 컴퓨터 전문가 레빈슨 박사가 함대 모선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외계인을 물리친다는 대목이다.
바이러스가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감염은 같은 운용체계(OS)를 쓰는 컴퓨터 사이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IT 상식이다. 인디펜던스데이가 개연성을 가지려면 외계인은 윈도가 깔려 있는 컴퓨터를 써야 한다. “외계인에게 윈도를 팔다니 대단한 빌 게이츠”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이처럼 IT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재미와 사실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신간 ‘제로데이’는 이 균형을 잘 맞췄다.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라는 어려운 내용을 쉬우면서도 긴장감 넘치게 풀어냈다.
저자 마크 러시노비치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기술 부문 최고 직책인 ‘테크니컬 펠로우’로 근무 중이다. MS 전문 간행물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소설의 개연성은 저자의 경력만 봐도 안심이 된다.
물론 더 중요한 요소는 소설적 재미다. 소설은 911 테러로 애인을 잃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 제프 에이킨이 엄청난 사이버 테러 세력을 발견하고 싸워나간다는 줄거리다. 현실 세계의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테러를 저지르는 자와 막는 자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펼쳐진다.
초입부터 최첨단 항공기가 시스템 문제로 대서양에 추락할 위기에 처하고 자동차 공장의 조립 로봇은 사람을 공격한다. 원자력발전소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가 바뀌며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이어진다.
소설의 제목인 제로데이는 컴퓨터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자마자 삽시간에 퍼지는 공격을 의미한다.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수많은 컴퓨터를 파괴하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은 공포의 대상이다.
2011년은 사이버 테러로 얼룩진 한 해다. 소니를 비롯한 대기업과 각국의 정부기관이 공격을 받았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공격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테러가 악용됐다. 이른바 ‘핵티비즘’의 등장이다.
이 소설은 독자에게 사이버 테러를 재조명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 빌 게이츠는 “마크 러시노비치는 윈도의 성능을 높이더니 이제는 설득력 있는 스릴러 소설로 사이버 테러리즘의 경각심을 높였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무슬림 세력의 서방 공격을 미국 주도로 막아낸다는 ‘팍스 아메리카나’ 정신은 눈에 거슬린다. 물론 미국인이 쓴 상업소설에 무슬림이나 테러리즘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찾기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마크 러시노비치 지음, 김지량 옮김. 제이펍 펴냄. 가격 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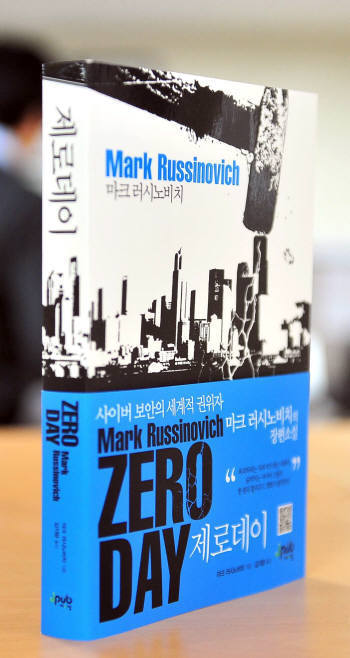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