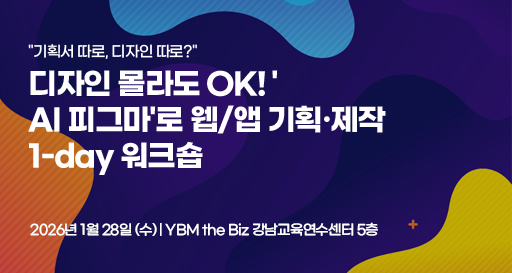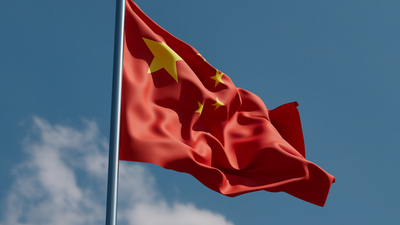모처럼 찾아온 연휴. 신문에 난 맛집 소개기사를 보고 찾아간 식당의 음식 맛이 기대이하일 때가 있다. 허탈하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등산화를 신고 가을 산행에 나섰는데, 등산길 초입에 통행세를 받는 사무소와 마주친다. 통행세는 몇 천원에 불가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문화재 관람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거둬가는 현실이 싫다. 그 산을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
간혹 이런 뉴스도 네티즌들의 도마에 오른다. 일부 고급 아파트들이 신문과 우유 등을 배달하는 업체에 소위 통행료를 물리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전기료와 스마트키 발급 비용이지만, 있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에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보자. 배경은 독일이다. 수백년전 독일 라인강은 사람들의 주요 이동통로이자, 해상운송의 핵심이었다. 많은 배들은 라인강을 오가면서 교역물자를 실어날랐고, 생활 필수품을 전국 곳곳에 전달하기도 했다. 평온하게만 느껴졌던 독일 라인강 물살은 하지만 어느 순간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라인강변에 있던 A라는 성주가 자신의 성 앞을 통과하는 배에 통행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제2, 제3의 A가 나타났다. 너도 나도 통행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라인강을 지나 다니던 배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해상운송 경기는 침체됐고, 그 결과 이 지역 경제경제도 타격이 불가피 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가치가 더 평가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무형의 자산인 특허 역시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 문제도 일상과 뗄레야 뗄 수 없다. 가족 또는 회사 동료의 자녀 가운데도 저작권 문제로 상처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창작의지를 꺾는 불법 다운로드는 단속돼야 하고, 사라져야 한다.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댓가가 지불돼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자고 나면 새로운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다. 권리자들의 목소리만 전달되고, ‘공정이용’과 ‘카피레프트’ 운동을 주창하는 의견은 잦아들고 있다. 등산객들이 산을 찾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가을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