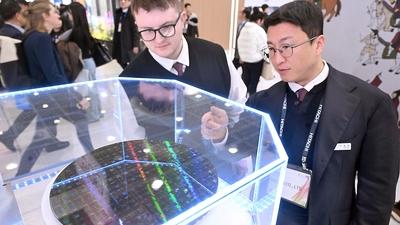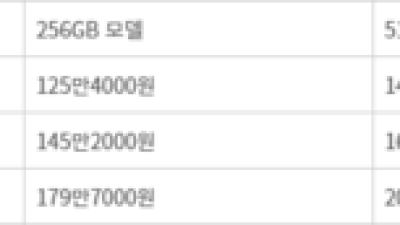KT가 지난주 2015년 청사진을 발표했다. 금융과 미디어, 글로벌 등 비(非) 통신사업 부문의 비중을 45%로 높이고 매출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이다. 시장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목표다. 짧은 기간에, 그것도 새 분야에서 매출을 두 배 이상 늘리기 어렵다. 그래도 다가올 통신 쇠퇴 위기를 융합과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산다. 지난해 매출 20조원 첫 돌파와 영업이익 2조원 시대를 연 기세를 이어가 꼭 소망을 이루길 바란다.
선결 과제가 있다. 업계를 선도할 만큼 KT 스스로 혁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 협력사와 함께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기술과 시장 변화가 워낙 심해 ‘졸면 죽는’ 불확실성 시대에, 융합과 공유, 참여로 이뤄진 새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최소한의 덕목이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을 시도했다. 민영화 이후 몇 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던 공기업 얼룩을 많이 뺐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 임직원은 여전히 혁신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문다. 외부 영입 인사들의 가시적인 성과도 아직 없다. 혁신 피로감과 내부 갈등 요소가 별다른 해소 없이 계속 쌓인다.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이 회장이 올해 내부 동력을 확 끌어올리지 않으면 변화는 커녕 뒷걸음질할 수 있다. 그의 연임도 멀어진다. 어느 순간, 이 회장 외에 KT 대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영 혁신의 연속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 회장은 연임을 위해서라도 차세대 주자를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
KT는 협력사 동반성장을 강조해왔다. 성과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않으며, KT로 인한 자원 낭비를 없애겠다는 ‘3불(不) 선언’은 지난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모바일 벤처 창업 지원과 2차 하도급 관행 개선도 선언했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바깥의 시선은 아직 따뜻하지 않다. KT 목동은 농협 양재동 등과 함께 ‘IT개발자의 무덤’으로 여전히 회자된다. ‘이 회장 취임 이후 조금 나아졌다’는 수식어가 새로 붙었을 뿐이다.
‘통합 이후 KT 혁신은 결국 아이폰 도입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회사의 다양한 노력을 폄하한 말이지만 조금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나라 모바일 생태계를 바꾼 이는 애플이지 KT가 아니다. 필요하면 외부 힘을 빌릴 수 있지만 그게 전부여선 곤란하다. KT가 육성하는 금융, 미디어, 글로벌 사업만 해도 경쟁사가 먼저 개척했다.
합병 2주년을 맞은 날에 축하의 말 대신 쓴 소리만 늘어놓았다. 우리나라 통신 대표주자 KT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 업계 리더를 유지하고 비전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KT 임직원은 스스로 산업계를 선도한 혁신이 과연 뭐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거기에 2015년 비전의 답이 있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