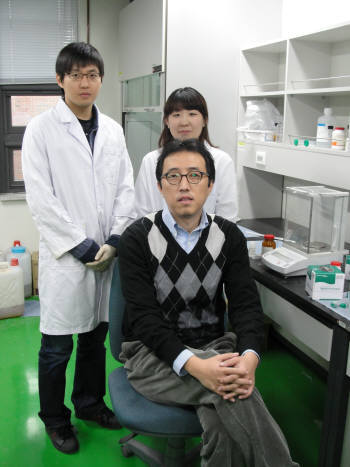
‘나노 인공위성.’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강태욱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직접 붙인 이름이다. 한 개 세포 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포 하나의 크기보다 더 작은 규모의 기술이다.
강 교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노 기술을 통한 암세포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나노 인공위성을 “체내 세포의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리포터’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세포 내에서 언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세포 내 특정 형광 물질을 삽입해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다. 하지만 형광물질은 마치 한 번의 순간밖에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초에서 수분까지 관찰해 결과를 얻어야 하는 진단에는 쓰일 수가 없다.
강 교수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루크 리, 최연호 고려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 주변에 산란 진동수와 유사한 흡수 진동수를 갖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면 입자에서 주변 화학물질로 에너지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최초로 발견, 이를 세포 현상 진단에 적용해 ‘나노 인공위성’을 고안해냈다.
또 이들 공동 연구진은 미세 온도차를 이용한 분자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강 교수는 “세포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을 하려면 세포를 ‘가둬야’ 하는데, 문제는 가둔 세포를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미세한 온도 차이를 주면 분자가 농도 차이에 의해 움직인다. 온도차가 있을 때 분자가 움직인다는 게 잘 와 닿지 않겠지만 분자 개별적으로 봤을 때 고온이나 저온을 좋아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다. 그런 미세온도차를 이용해 DNA나 단백질 등을 한군데 모으거나 방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자신의 연구분야를 “BT와 NT의 경계선에 있다”고 표현했다. 말 그대로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융합 연구다. 그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연구할 당시 맺었던 인연으로, 루크 리·최연호 두 교수와 역할 분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 교수가 바라보기에 국내 융합연구 환경은 좋지 않다. 그는 “융합연구란 수개월 만에 결과가 쉽사리 도출되는 게 아니다. 기존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융합연구센터 구축 등 물리적인 지원도 좋지만, 이보다도 타 분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의 자세와 끈기, 또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구에 대한 ‘묻지마 지원’의 문화가 정착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참 부족하지만, 프론티어 사업 등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향후 ‘나노 인공위성’의 리포터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나노 기술을 이용해 개복 수술 없이 암 등의 세포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 그는 “기존 진단·치료법을 훌륭하게 보완하고 나아가서 서서히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