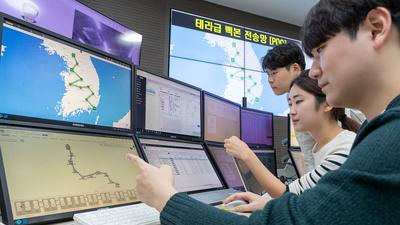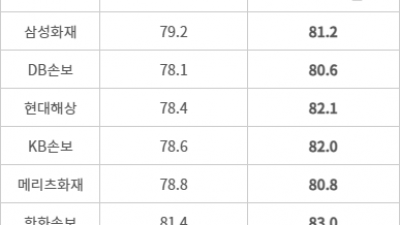지방선거 정국에 무료요금 공약 난무…
통신업계가 지방선거정국을 맞아 정치권과 정부에 또다시 휘둘리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초당 과금제가 결국 도입됐다.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제한하는 마케팅비 가이드 라인 제정도 앞뒀다.
업계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정치공세가 시장의 자율경쟁보다 앞선다며 우려했다. 통신업계는 특히 지방선거 직후에 광역 지자체별로 진행할 ‘무상 무선인터넷 사업’에 잔뜩 긴장했다. 여야 모두 이를 6·2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밀었다.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은 투자와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무료 이용권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으로 내놓았다. 스마트폰 보급 등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20·30대 유권자를 인식해 마구잡이로 던진 공약이다. 대부분의 지방선거 후보들은 해당 통신사업자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선거전략을 내놓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건물 한 동을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통상 3억원가량이 든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한 해 수천만원”이라며 “지금의 정황상 이 부담을 사업자가 짊어져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분기에만 실버요금제 강화, 3개월 미사용 비과금 등 4∼5건의 통신정책이 정치권과 정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서민경제 개선 등을 이유로 각종 통신비의 인하와 무선인터넷 무료화를 요구한다. 모두가 그릇된 요구는 아니다. 3개월 미사용 비과금과 같이 소비자 권익의 사각지대를 찾아낸 정책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권발 정책은 자율적인 시장 논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규제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업무를 담당하는 ‘대관 조직’을 줄였다. 최근에는 이 조직을 다시 늘려서라도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정창덕 고려대 교수는 “시장 논리는 없고, 다만 정치적 이해와 정책적 고려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할 때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