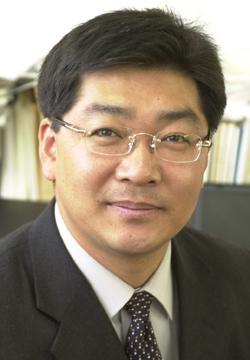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69년 7월 미국은 세계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다. 구소련이 세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지구 상공으로 올려보낸 지 12년 만의 일이다. 당시 세계가 열광했다. 39년 뒤인 지난해 중국은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를 창정 2F로켓에 실어 보냈다. 인도도 지난해 10월 인도 첫 달 탐사선 ‘찬드리얀 1호’ 발사에 성공했다. 유럽, 일본, 브라질 할 것 없이 ‘힘깨나 쓴다’는 나라들이 우주개발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이들이 우주, 특히 달 탐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첨단 기술력 및 국력의 과시, 새로운 자원에 대한 선점 때문이다.
실제로 UN의 우주 조약이나 달 조약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우주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어서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달에 갈 능력을 보유한 나라는 누구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경쟁의 현실이다.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무수한 첨단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예도 많다. 엑시머 레이저와 액체 골프공, 전자레인지, 형상기억합금,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이 모두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됐다. 요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드릴이나 전기톱이 달 표면을 뚫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레이저빔이나 HDTV시대, 차량용·휴대형GPS, 성에가 끼지 않는 스키안경, 지도제작, 재난방지의 신기원 위성영상, 대체에너지연료전지, 위성전화, 위성TV, 인터넷, 위성원격교육, 위성 원격의료서비스, 항공기 이착륙시스템, 해상탐색시스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이 모두 우주 관련연구에서 비롯됐다.
미국에서 유인우주선 아폴로 개발에 관여하다 귀국해 KAIST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박철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사업이 처음부터 수지 맞는 사업은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과학기술 올림픽 ‘쇼’와 같은 종목”이라고 강조한다. ‘우주’에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걸어도 좋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주산업은 기술로서 인간이 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분야”라며 “달 탐사 프로그램 운용 자체가 국가 전체의 기술력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향후 10년 뒤인 2020년께면 달 궤도선, 2015년 뒤엔 달 착륙선을 우주상공으로 보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았다. 올해엔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 ‘KSLV-1’의 자력 발사와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가 예정됐다. 국제우주대회(IAC)도 열린다. UN이 정한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우주 관련 이벤트도 마련됐다.
물론 전체 R&D 예산의 10%를 우주에 쏟아 붓는 미국과 3%만을 투자하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투자 규모의 절대 크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쏘아올린 우리별 위성 시리즈나 발사체 KSR 시리즈, 다목적실용위성 등의 성과는 모두 악조건 속에서 이룩한 것들이기에 다가오는 의미는 배가된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신년사에서 선언한 대로 올해가 ‘대한민국 우주 독립국 원년’이 돼 경제난을 이겨내는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전국취재팀장 박희범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