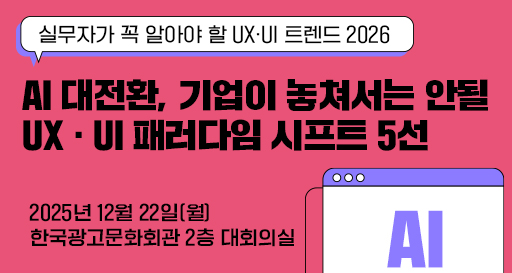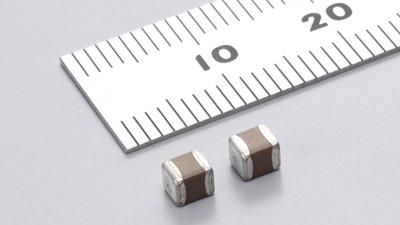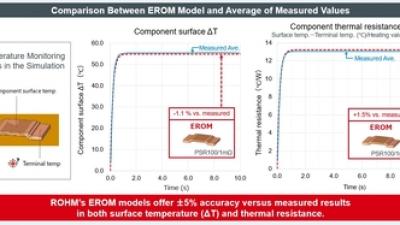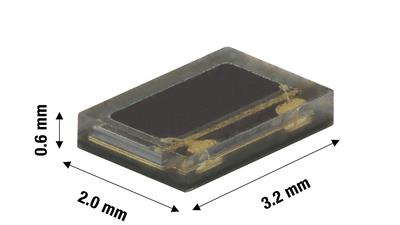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비록 시신이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길이라도 곱게 보내야지요….”
쓰촨성 대지진 이후 가슴 아픈 사연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절규가 연일 현지 언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내의 시신을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는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의 눈물을 자아냈다. 축 늘어진 아내의 시신을 떨어지지 않게 자신의 몸에 꽁꽁 동여매고 영안실을 찾아가는 사내의 모습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쓰촨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곱게 보내고 싶다는 사내의 무표정한 얼굴이 더욱 슬프게 다가온다.
허리케인이 할퀴고 간 미얀마의 현실도 참혹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대강 짐작만 할 뿐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남은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 뿐이다. 자신의 아들·딸로 추정되는 옷가지만 보고 하염없이 통곡하는 촌로의 모습이 안타깝다 못해 화가 치민다. 군정에 핍박받고 자연재해에 시달리다보니 사람들의 눈빛은 ‘멍’하기만 하다. ‘설상가상’이란 말을 이런 때 하는 것 같다.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 위로와 동정이 고작이다. 부글부글 끓는 지구를 당해낼 방법이 없고, 사납게 다가오는 강풍을 막을 재간이 없다. 그나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만 원천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자연 재앙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벌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신에게 지은 죄는 무엇일까. 오만과 독선이다. 여기에 이기심으로 가득찬 환경파괴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다.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개간한 땅은 사막화됐다. 이제와 복구하려니 비용이나 시간 모두 엄두가 안 난다. 심지어 얼마전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전지판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묻었단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초등학교 운동장을 팠겠지만 대가는 고스란히 후대가 지게 될 것이다.
지진이 인간의 환경파괴로 귀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재앙의 상당수가 무책임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파괴에서 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뒤늦게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과 의정서가 난무하지만 구속력이 떨어진다. 경제이익이 우선이고 환경은 차순위다. 비단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자연의 경고는 모두의 일이고 이익은 나의 일이다.
공동의 재산을 지키자고 ‘탄소배출권’을 사고판다. 환경이 재개발 ‘딱지’도 아닌데, 쓰레기 배출 권리를 거래한다. 환경파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적당히 어기고 돈으로 지급하면 된다. 가격이 비싸서 초과 배출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기도 하겠지만 탄소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앙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지진피해를 당한 중국 사내의 애처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오토바이 뒷좌석에 널브러진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어떻게 해서든 환경을 매개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재앙은 막아야 한다.
이경우부장, kwlee@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43〉2026 AI 전망, 이제는 일하는 '에이전틱 AI'시대
-
2
[ET톡]과기계 기관장 공백 언제까지
-
3
[ET단상] 나노 소재, AI로 '양산의 벽'을 넘다
-
4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문서의 새로운 가치: '보관'을 넘어 '활용 자산'으로
-
5
[관망경]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 바란다
-
6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20〉AI 주치의 시대 열려면-한국 의료 혁신의 첫 단추는 API 개방
-
7
[기고] AI 대전환 시대, 표준은 어떻게 '인류의 신뢰 인프라'가 되는가
-
8
[박영락의 디지털 소통] 〈42〉부천시와 충주시, 지자체 디지털소통의 기준점을 제시하다
-
9
[사이언스온고지신]기후위기라는 미지수 앞에서, 지하수를 '상수'로 만드는 길
-
10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연임 내정…내년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