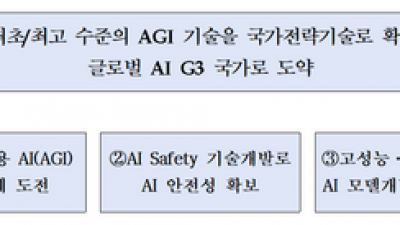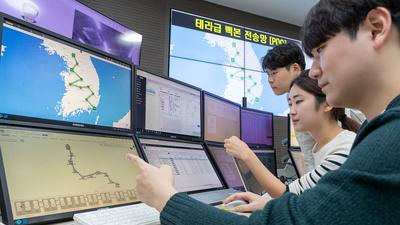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이야기 하나
미국의 CES나 독일의 세빗(CeBIT)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IT전문 전시회다.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다. 정작 IT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엔 왜 이런 전시회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다. 특히 그곳 전시에서 관람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제품이 대부분 우리나라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일 경우 그 궁금증은 답답함으로 변한다.
전시회가 성공하려면 보통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첫 번째는 신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시회에 가면 앞으로 1∼2년간 시장을 지배할 기술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전시를 개최한 나라가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시 참가업체들이 아예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IT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다. 또 바로 옆에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끼고 있다. 최첨단 기술의 시험장과 경연장 성격의 전시를 하기에는 최적인 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IT 전시는 ‘안방잔치’ 성격이 대부분이다. 매년 20여개의 크고 작은 IT관련 전시회가 개최되지만 그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시주관업체나 언론사들의 관성에 의해 열릴 뿐이다. 이에 따른 질저하 현상도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젠 우리도 그야말로 ‘전시를 위한 전시’를 하는 비효율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IT코리아를 웅변으로 증명해 줄 만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대형 ‘IT외교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SEK 2006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야기 둘
SEK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국내 IT 전시회로는 거의 유례없는 기록이다. 지난 87년부터 SEK는 매년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한국 IT의 역사를 써내려 갔다. SEK가 던진 화두는 항상 적절한 시점에 국내 IT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80년대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필요성을 알렸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 혁명을 예고했다. 2000년 들어서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설파했고 미래전략으로 모바일과 컨버전스 관련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SEK는 이처럼 항상 한발 앞선 기술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국내 최대 IT 전시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컴덱스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들이 빛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SEK는 매년 참여 업체와 전시규모를 늘리며 국내 IT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 신기술의 경연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게 그 원동력이었다.
스무해를 맞는 올해는 더욱 풍성하다. 380여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1000여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국내 최대 전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SEK2006의 백미는 역시 신기술의 발표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4G와 관련된 신제품을 발표하며 KT와 SKT도 유무선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통신서비스를 선보인다. 한글과컴퓨터는 차세대 웹서비스 크레팟을 처음 소개하며 안철수연구소가 ‘모바일 백신’의 국내 첫 시연행사를 갖는다. 올해 말 출시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비스타’와 ‘2007 오피스 시스템’도 미리 관람객을 찾아간다.
올해는 특별히 세계 각국의 유력 매체를 선별해 50여명의 해외기자단을 초청한다. 우리 기술을 안방에서 먼저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도다. IT 신기술의 향연장을 열어 최소한 4일간만이라도 세계의 이목을 우리나라로 쏠리게 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또 SEK가 IT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 간판 전시회로 육성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제 CES나 세빗에 어깨를 견줄 만한 규모의 전시회를 가질 때가 됐다.
김경묵부장@전자신문, kmkim@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