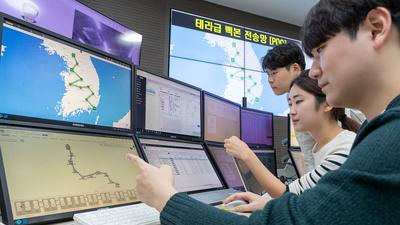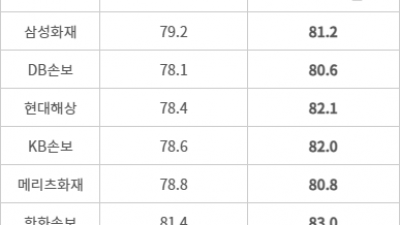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하지만 진전이 없다. 세월만 죽이는 셈이다. 통신과 방송 융합에 따른 통합기구 발족이 그렇다. 이달 들어 벌써 통·방 융합에 관한 세미나가 네 차례나 열렸다. 과실연과 디지털뉴미디어포럼·한국방송학회·한국혁신학회 등이 통신과 방송 융합을 주제로 각기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도 조직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음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지난 10여년간 통신과 방송 융합을 논의한 결과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그동안 세미나만 100여 차례 열렸다. 관련 논문만 200편이 넘는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목청 높여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니 같은 논쟁을 또 얼마나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통신과 방송 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수용해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임무다.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통합기구를 발족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상책이다. 기술발전에 역행하면 빈국(貧國)이 되고 만다. 이는 역사의 냉엄한 교훈이다.
통신과 방송 융합이 불가항력적인 시대의 흐름인데도 통합기구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은 규제기관 간의 견해 차이다. 가령 IPTV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통신으로 보지만 방송위원회는 방송이라는 시각이다. 하기 쉬운 말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속내를 뒤집어 보면 해법이 간단하지 않다. 누가 통합기구의 주체가 되느냐가 곧 조직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합기구의 주체가 된다면 다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 조직은 살아남는다. 그 반대면 조직이 퇴출될 수도 있다. 통합기구 논의는 해당 부처에는 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러니 10여년간 수많은 사람이 해법을 제시해도 진전이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1년 반가량 재직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최고위원이 과실연 통·방융합 정책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조직 축소나 확대에 관한 일은 부처 간 격렬한 대립을 가져온다. 국민 처지에서 보면 시급한 사안이지만 부처에는 생존이 걸린 일이다. 그러니 미적거릴 수밖에 없다. 장관도 그 조직을 보호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 등 최고위층이 만나 통합기구 발족을 논의해도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국회가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청이 높다. 정부가 제 머리를 못 깎으니 국회가 나서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국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여야로 나뉜데다 국회 문광위와 과기정위 간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더욱이 5·31 지방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다. 선거 후에는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러니 국회에도 기댈 것이 못된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아래서는 통·방융합 기구는 물 건너갔다는 말도 한다. 만의 하나 이렇게 되면 당장 신규 서비스사업자들만 속이 터질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다. 사업자들은 지금 출발점에서 심판의 출발 신호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어차피 통합기구 설립은 시간이 걸릴 일이다. 그렇다면 신규 융합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옳다. 아울러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 조건이나 절차도 명확해 해야 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문제를 하나씩 풀자. 그래야 진전이 있다.
이현덕주간@전자신문, hdlee@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