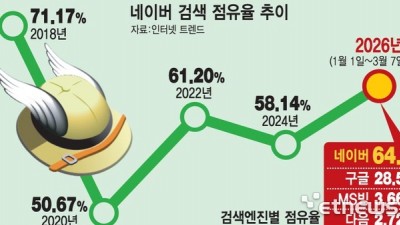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5 북미시장 월별 활동내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5 북미시장 월별 활동내용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의 콜럼버스 서클. 12월의 뉴욕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린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외투를 파고 들어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춥다. 뉴요커들이 바쁘게 거리를 오고 간다.
며칠 계속된 버스와 지하철 파업으로 걷는 게 일상화가 되어버린 뉴요커들의 복장은 가지각색이다. 추위를 피하려 털모자를 눌러쓴 사람, 밍크코트를 입은 남미계 아줌마, 힙합바지를 입고 MP3를 듣는 사람들, 거리는 사람들로 넘친다. 연말 뉴욕 길거리 스케치에 나선 NBC 방송국 카메라맨은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한손으로 연신 ENG카메라를 돌려댄다.
록펠러 건물에는 올해도 여김없이 수십피트짜리 성탄 트리가 세워졌고, 그 아래 분수대를 얼려 만든 스케이트 장에서는 수백여명이 일사분란하게 겨울을 즐기고 있다. 뉴욕 맨하탄의 세밑 풍경이다.
◇코리아 인 뉴욕=맨하탄 타임스퀘어는 불야성을 이룬다. 전세계 대기업들의 로고와 제품들이 네온에 번쩍인다. 그곳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다. 춥고 어두운 밤이지만 우리 기업의 네온 불빛은 2005년 12월 뉴욕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인파 속에 ‘애니콜’ ‘사이언’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띈다.
세계 최고의 소비 도시 뉴욕. 자본주의의 대표국가, 그 중에서도 최고 도시답게 뉴욕에는 가난함과 부유함이 함께 공존한다. 지하철 역에서 구걸을 하는 부랑아부터 최고급 벤츠를 몰며 다니는 부유층, 그들을 뉴요커라 부른다. 뉴요커들은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안다. 기업이 국가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다.
“삼성과 LG를 압니다. 휴대폰과 TV,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죠. 집에 한두개쯤 이들 회사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라고요? 몰랐어요. 일본 회사인줄 알았는데.” 맨하탄 인근에서 가장 큰 베스트바이 매장인 뉴저지 버겐카운티 가든스테이트 매장에서 만난 리차드 위치(Richard wyche 35세)씨의 말이다. 학교 교사인 그는 우리나라 제품 휴대폰을 들고 ‘굳’을 연발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북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이들 기업은 유통시장 확보를 위해 베스트바이와 서킷시티를 자기 집 드나들 듯 방문했다. 이미 세계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삼성과 LG전자의 부상을 알고 있었지만, 바잉파워가 막강한 북미 유통 시장 특성상 유통 시장 공략은 만만하지 않았다.
북미 시장은 정보가전 업체에게 난공불락으로 여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진출하고 마지막 공략 대상으로 삼는 곳이 북미 시장이다. 그만큼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소비자 특성이 뚜렷하지 않고, 유통 시장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제조 업체로서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과 LG전자의 유통 시장 진출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전세계 광고비중 50% 이상을 쏟아붙고도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워낙 다양한 계층과 인종,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사는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은 전세계 시장의 성공을 좌우하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올림픽 스폰서십을 비롯해 조 토레 양키즈 감독, 매직 존슨 등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이른파 자선기금 조성, 각 지역에 맞는 판촉 활동을 수 없이 전개했다. 미 전역에 휴대폰 홍보를 위해 버스로 주요 도시를 찾는 버스투어도 감행했다. 무모하지만 용기있는 도전이었다.
◇북미 유통 시장을 잡아라=우리 기업은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등 대형 유통 매장에 주목했다. 우선 제품 품질이 좋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방법은 CES 등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중점을 뒀다.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매장 부스를 확대했고,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썼다.
세계적인 전시회에 ‘메이드인 코리안’의 제품은 가장 크고 화려하게 포장됐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간 가려져 있던 국내 가전 제품 품질이 세계 수준이라는 점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CES의 혁신 대상과 각 정보가전 전시회 디자인상과 마케팅상을 죄다 휩쓸었다.
다음에는 한국인의 친화력이 이어졌다. 경쟁국의 기업 대표가 불과 몇번 방문했던 가전 매장을 우리 기업 CEO는 출장길에 수시로 방문했다. 현지 주재하는 대리점 담당자 조차 보지 못했던 베스트바이와 서킷시티 직원들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콧대 높던 유통망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뒤에 박스채 포장돼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 TV와 에어컨, 세탁기, 휴대폰이 진열대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우리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알고 있던 뉴요커들이 앞다투어 구매에 나섰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제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어지자, 해당 유통 대리점과 자료 공유가 이어졌다. 한국에서 미국 베스트바이 매장의 판매 상황과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던 것이었다. 현지 매장에 대한 재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현재 당신이 관리하는 매장에는 32인치 LCD TV 재고가 한대도 없습니다. 판촉 활동으로 모두 판매됐기 때문입니다. 스무대 가량을 입고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입고를 요청한 냉장고는 이미 2주전 열대가 납품돼 이중 세대가 판매된 상태입니다. 지금 납품보다는 판매 상황을 보아가며 주문해도 될 것같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총괄 소속 맨하탄과 뉴저지의 베스트바이 매장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의 말이다. 미 전역 640여개 베스트바이 매장이 이렇게 관리된다. 서킷시티도 마찬가지다.
세계 가전 업체에게 북미 시장은 꿈의 대륙이다. 북미 시장에서 ‘대약진’을 한 우리 기업에게 외국 기업은 ‘기적(미라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거둔 성공은 하루 업무 시간을 8시간이라고 여기는 경쟁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업무시간을 24시간으로 여기는 대한민국 현지 주재원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노력’일 뿐이다. 적어도 2005년 뉴욕 맨하탄에서는.
뉴욕(미국)=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