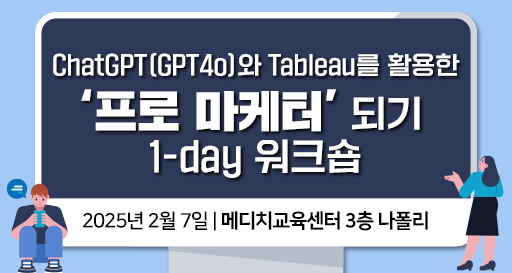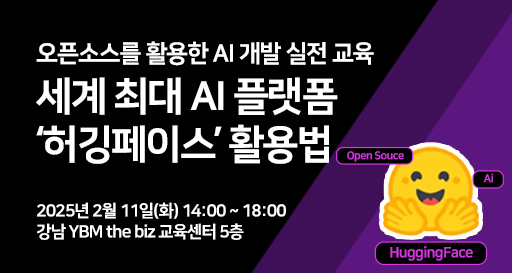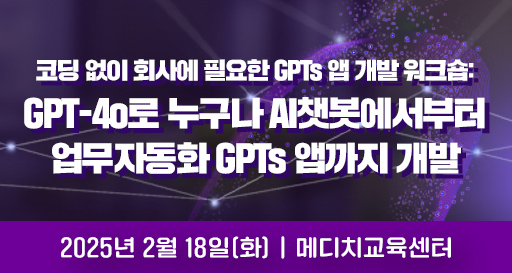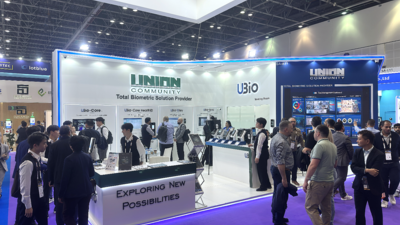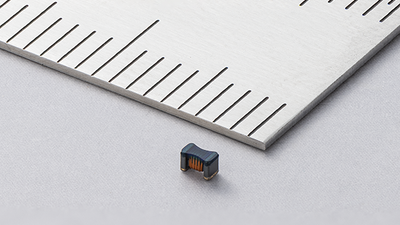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가만있자…내 일정이 어떻게 되지…” 하면서 PDA를 꺼내는 50대의 남자.
한국전산원 윤병남 지식정보기술단장(53)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수더분하고 사람 좋은 인상에 이웃집 아저씨를 떠올린다.
그러나 PDA를 꺼내 일정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그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명함을 받아보면 ‘아…’한다.
윤 단장은 70년대부터 한국IBM과 함께 컴퓨터업계 쌍벽을 이룬 스페리에서 ‘유니백’ 컴퓨터 엔지니어를 거쳐 초창기 육군본부 컴퓨터요원으로 활동했던 정통 IT맨이다.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요부대에 텔레타이프를 설치, 초보단계 정보화를 추진하기도 했었지요. 사실 컴퓨터의 성장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초기 정보화만으로도 당시 일선에서 결정권자에게 올라가는 정보집계 및 보고시간이 5분의 1은 줄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강국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과연 그 토양에서 한국은 무슨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는지 궁금해 한다. 윤 단장은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도 바로 이 같은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T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개발한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평생 해온 일들이 국가를 위해 보탬이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이공계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은 그들이 쏟은 열정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문연구직은 더해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 ‘돈되는 다른 일’을 기웃거리게 된다.
“저도 사실 노후에 대해 적지 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의 지식을 최대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이재명 “AI 투자 위한 추경 편성하자…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
2
美 필리델피아서 의료수송기 번화가 추락...사상자 다수
-
3
“너무 거절했나”... 알박기 실패한 中 할아버지의 후회
-
4
SK온, 3사 합병 완료…“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 도약”
-
5
수출 16개월 만에 꺾였다…조업일 감소로 1월 10.3%↓
-
6
유출된 아이폰17 에어 후면 패널 보니… “카메라홀은 하나”
-
7
올가을 출시 아이폰17… '루머의 루머의 루머'
-
8
오픈AI, 추론 소형 모델 'o3 미니' 출시… AI 경쟁 가열
-
9
화성시, 19.8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돌입
-
10
광주시, 2025 동계 대학생 일자리 사업 성공적 종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