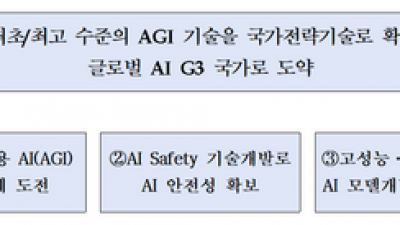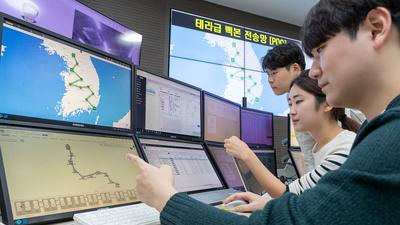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별 휴대인터넷 서비스 현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별 휴대인터넷 서비스 현황 2.3㎓ 휴대인터넷이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이 휴대인터넷의 상용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KT에 이어 SK텔레콤이 신수종 사업으로 휴대인터넷을 선정,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하나로통신·데이콤 등도 테스트를 마쳤거나 시범서비스에 들어가는 등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장비업체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왜 휴대인터넷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기술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지난 3월 호주의 CKW사는 시드니·멜버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캐나다의 벨캐나다사도 매니토바·처칠 지역을 대상으로 2.3㎓ 휴대인터넷 상용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유럽의 BT도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위해 주요 도시의 핫스폿 확대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넥스텔·스프린트사 역시 워싱턴과 시카고 지역의 필드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용서비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WCDMA 상용서비스에 들어가 3G서비스의 주도권 확보를 선언한 일본도 올해 안으로 2.3㎓의 휴대인터넷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 아래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올해 안에 테스트베드 성격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2.3㎓ 휴대인터넷 상용서비스에 들어갔거나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업체들도 세계 통신업계의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KT가 올해 최대 중점사업으로 휴대인터넷(네스팟)을 꼽고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SK텔레콤도 휴대인터넷을 차세대 수종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 무선 초고속인터넷으로 대변되는 휴대인터넷을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물론 현재는 산업·과학·의료(ISM)용 비허가 대역인 2.4㎓를 이용한 서비스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2.3㎓ 휴대인터넷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2.3㎓ 휴대인터넷이 왜 관심을 끌고 있는가.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차세대서비스인 유무선통합서비스의 기술 리더십의 확보를 주요 이유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3세대인 WCDMA를 건너뛰어 3.5세대격인 2.3㎓ 휴대인터넷서비스의 기술리더십을 확보해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더 많은 기존 2.4㎓의 무선랜 인프라와 향후 시작될 5㎓ 무선랜과 연계해 음성과 데이터통신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유무선통합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것.
나아가 유선사업자는 이를 통해 무선사업에 진출하고 무선사업자는 유선 기반의 데이터사업에 진출하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통신서비스시장의 확고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유선사업자의 경우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등을 이용해 휴대인터넷과 무선랜·이동전화 등을 하나의 단말기(IP폰이나 PDA폰 등)로 제공하는 원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동전화사업자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3㎓ 휴대인터넷은 가장 안정적인 차세대 신규 수익원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2.3㎓ 휴대인터넷은 이미 수익성이 입증된 기존의 유선기반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그대로 무선으로 옮겨올 경우 수익의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유료서비스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의 전달경로나 e비즈니스 통로로서의 휴대인터넷이 갖는 매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휴대인터넷을 위한 2.3㎓ 주파수의 경우 용도만을 확정했을 뿐 주파수 할당을 늦추고 있다. 정부 일정대로라면 올해에는 주파수 할당방법, 사업자허가 방침과 시기, 적용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만 마치고 내년말쯤가야 사업자한테 주파수가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2.3㎓ 휴대인터넷을 위한 테스트를 이미 마치는 등 준비상황은 앞서 있으면서도 정부 일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선진국보다 2년이나 늦은 오는 2005년께나 돼야 무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