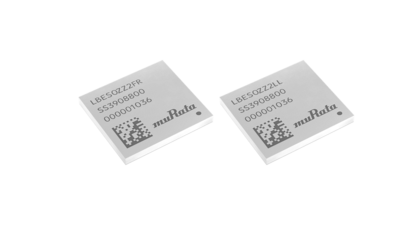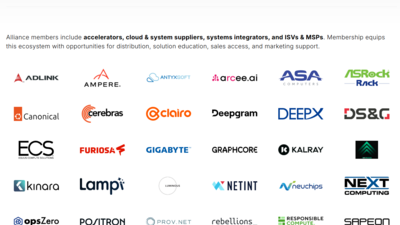벤처캐피털들의 겨울도 벤처기업 못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벤처기업이야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벤처캐피털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할게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벤처캐피털들의 가장 분주한 작업은 손실처리를 해야 할 기업들을 분류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40여개 벤처캐피털 중 지난해 이익을 거둔 기업이 전체의 5%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이나마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의 이자수익으로 올린 것이다.
일부에서는 ‘묻지마 투자’가 한창이던 지난 99년과 2000년에 설립된 투자조합 만기가 돌아오는 2004년에는 아예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 높은 평가를 토대로 투자했던 조합의 만기가 돌아오는 2년 뒤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앞으로 3년 안에 해산될 조합의 자금규모는 모두 2조714억원이다.
코스닥시장이 갑자기 커지거나 획기적으로 다른 회수시장이 생겨나기 전에는 2조원의 돈이 3년 안에 회수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KTB네트워크는 지난 99년과 2000년에 본계정(자본금)과 투자조합을 모두 합해 각각 1300억원과 3200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800억원을 회수했을 뿐이다.
한국기술투자도 200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조합 6개 중 3개가 20%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무한투자는 4개 중 2개 조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이미 벤처 한파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00년에 벤처투자 붐을 타고 경쟁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가운데 지난해 들어서만 20개 창투사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했다. 연초 145개에 달했던 창투사 수는 128개로 줄어든 상태다.
한때 최고의 선호 직종이었던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벤처캐피털회사 임원인 A씨는 최근 10년이 넘는 벤처캐피털리스트 생활을 접고 사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또 M투자회사의 기획업무를 담당한 B씨도 비슷한 이유로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반도체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9년 이후 벤처투자 거품이 일어나 많은 벤처캐피털회사들이 앞다퉈 신규인력을 영입했지만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자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하며 많은 인력들을 밀어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도 적지않다. 회사를 떠나고 직업을 바꾸는 이직 바람은 벤처캐피털리스트는 물론 일반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같은 업계로 옮기기보다 대부분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했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안정된 회사로 알려진 대기업 계열의 N벤처캐피털 사장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심사역 30여명이 우리회사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신규직원을 뽑을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 벤처캐피털리스트는 그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을 상대로 공개 구직 e메일을 돌리기까지 했다.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회사인 KTB네트워크는 지난 2000년 4월 직원 수가 250명까지 늘었지만 두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110명 정도로 반 이상이 줄었다.
이같은 구조조정 열풍은 선발 대형업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K·L·M·H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도 중견 간부서부터 말단 심사역까지 많은 인력들이 이탈했다.
이제 더이상 누가 그만둔다거나 혹은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대화소재도 되지 못하고 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벤처캐피털들의 겨울은 길기만 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살상 드론 앞에서 마지막 담배 피운 러시아 군인 [숏폼]
-
6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7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8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9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