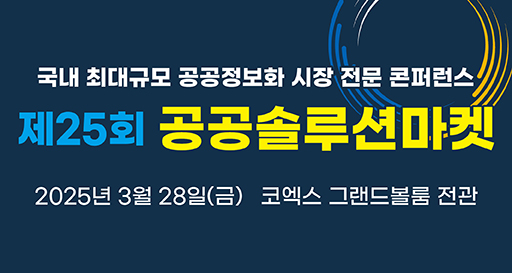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ICS 표준화 현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ICS 표준화 현황 IT산업과 첨단기술을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정부가 국가표준을 기술료(로열티)없이 제정한다는 원칙이 도마위에 올랐다.
무기술료 국가표준 원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표준규격(KS)이 태동할 때부터 적용돼왔다. 한국은 사실상 국가가 기술개발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무기술료 국가표준 제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국가가 아닌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특허를 국가표준으로 삼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 아직도 무기술료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국가표준 채택이전에 관련자들간에 무기술료에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제표준과 국가표준화 현장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각축장이 되고 있는 국제표준=MPEG2를 비롯한 각종 IT 국제표준은 선진기업의 각축장이다. 국가표준 제정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제표준에 채택될 경우 막대한 로열티 수입은 물론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업체들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MPEG2에서부터 MPEG7까지 동영상 표준화에는 기를 쓰고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한해에만 국내 특허권자들이 MPEG2에 채택된 기술로 벌어들인 로열티 수입만 1800만달러에 달했다.
◇외면받고 있는 국가표준=국가표준 제정작업은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자원부(KS규격)와 정보통신부(KICS규격)가 제정한 IT분야 국가표준은 각각 860종, 459종 등 총 1300종에 이른다. 이 중에서 국제표준규격을 채용한 건수가 각각 KS의 경우에는 740종, KICS의 경우 305종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고유규격의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기술료 원칙 때문에 국가표준이 제정속도가 느리고 시장지배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가장 큰 문제는 국가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를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는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일이 소요돼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기나 키패드의 3*4 자판 표준도 사실상 준비에만 5년이라는 기간을 끌었다. 당사자간에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간 무기술료 합의 원칙은 우수한 기술을 배제시킬 위험성도 매우 높다. 표준화 대상 기술이나 상품 중 특허권자가 끝까지 기술료를 받겠다고 고집할 경우 표준화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해당 기술이나 상품을 배제시키고 무기술료에 합의한 대상만으로 규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기술료 원칙은 관련 당사자들이 국가표준제정에 매우 소극적이도록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표준보다는 국제표준이 시장에서 더욱 중요시되면서부터 이같은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업계나 ETRI 등 연구계에서는 국제표준규격 제정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표준에는 상당히 수동적이다. 시장에서 국제표준이 더욱 중요해졌고 국가표준에 참여한다 해도 직접적인 득이 없기 때문이다.
◇기술료 없이는 세계주도도 없다=한국 IT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한국의 국가표준은 국제표준에서 항상 주변인에 머물고 있다. 장차 한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게 IT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비전이다. 최근 정부는 MS의 블루, 선의 자바와 경쟁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개발하고 국가표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표준인 WIPI를 세계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규격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기술료가 없는 WIPI를 국제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누가 적극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해당 업체들에 기술료를 받도록 해주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공짜가 표준화를 확산시키는 데 유리하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이미 화석이 돼버린 명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