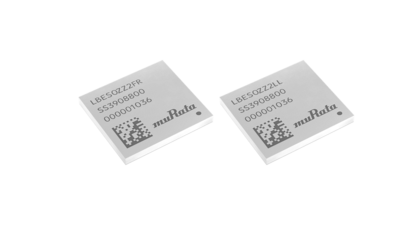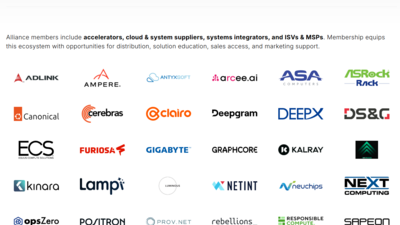최근 생체인식 관련 국내 워크숍에 참석한 미국 새너제이 주립대 짐 웨이먼 교수가 풀어놓은 자료 보따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그가 공개한 각종 생체인식 기술 평가결과를 보면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할 때 제품에 따라 100번 중 적게는 4번, 많게는 47번 에러가 난다. 입력후 6주가 지나면 많게는 10%까지 에러율이 높아진다. 얼굴인식은 입력후 며칠이 지나면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부율이 11%가 되며 조명만 달라져도 거부율은 9%로 뛰어오른다. 일년 반이 지나면 43%에 이른다. 음성인식의 거부율은 7%. 다른 번호에 다른 전화를 사용하면 100번 중 63번이나 인증에 실패한다.
물론 테스트를 위해 고의로 불량한 생체정보를 사용한 영향도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 기기 사용에 전혀 익숙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입력 후 시간이 경과하거나 주변환경이 변했을 때 생체인식 기술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온라인 인증 시대 보안문제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웨이먼 교수는 그러나 “사람이 직접 눈으로 신분증 사진과 사람을 확인할 때, 100번 중 34번이나 오류가 발생한 테스트 결과도 있다”며 “완벽한 기술이란 것은 없다. 얼마나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웨이먼 교수의 인식과 달리 우리 생체인식 업계는 아직도 거부나 오인식 확률을 0.01%니 0.001%니 따위의 수치로 포장하기에 바쁘다. ‘0’ 하나쯤 더 붙이는 일은 시험평가 담당자의 용기에 달린 일 같다.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해보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엄정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0.002%로 훌륭한 결과가 나왔지만 업계 분위기상 사실대로 발표할 수 없었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생체인식 기술을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는 아직도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내실없이 완벽을 과장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속도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 국내 업계는 첫발을 떼는 중요하고도 위태로운 시점에 있다. 게다가 잘 나가던 업체 하나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불미스런 사건의 중심에 섰다. 정직과 신뢰를 지켜내지 못하면 시장 형성의 첫단추부터 잘못 꿰게 된다.
<산업전자부·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살상 드론 앞에서 마지막 담배 피운 러시아 군인 [숏폼]
-
6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7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8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9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