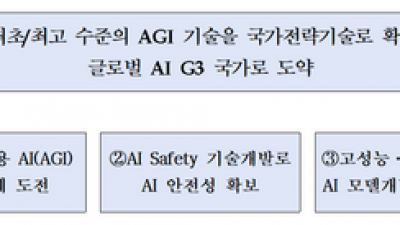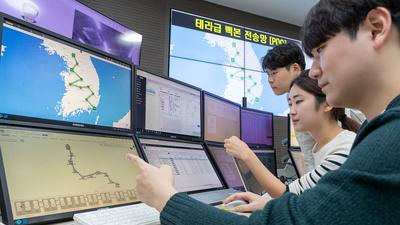MS·어도비시스템스·IBM 등 내로라하는 IT기업이 마침내 디지털콘텐츠 보호솔루션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내외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인터트러스트·컨텐츠가디안 등 그동안 이 시장을 주도해온 전문 업체는 물론 마크애니·실트로닉테크놀러지 등 국내 벤처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운용체계(OS)·애플리케이션·PC등 각 분야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과 기술력을 갖춘 이들 거대기업이 시장공략에 나설 경우 디지털콘텐츠 보호솔루션 시장은 순식간에 이들의 독무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경=세계 주요 IT기업의 이 시장참여는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다.
MS를 비롯한 주요 기업은 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콘텐츠 보호솔루션 시장도 함께 급부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분야에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 왔다. MS는 ‘윈도98’ 출시 때부터 OS차원에서 보호솔루션기능 제공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어도비시스템스는 인터넷문서 표준으로 널리 보급된 PDF프로그램이 이미 일종의 문서보호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 여기에 응용기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 진출을 암중 모색해 왔다.
IBM은 지난 99년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악복제 및 유통이 이슈로 떠오르자 디지털음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착수하면서 사업기반을 다져왔다.
IBM은 이를 계기로 이미지·동영상·텍스트 등 모든 데이터를 불법 복제 및 유통으로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로 사업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기반기술을 확보한 이들 기업은 진출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다 디지털콘텐츠 발전의 원년이 될 올해를 사업 진출의 시기로 선택한 것이다.
특히 세계 각국은 저작권법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을 기점으로 디지털콘텐츠 보호솔루션 시장은 발아단계를 벗어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업전개방식=업체별로 초기 사업전개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MS는 새로운 OS인 ‘윈도XP’에 디지털콘텐츠 보호 기본기능을 삽입했다. 이를 토대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일거에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도 OS차원에서 솔루션을 지원할 경우 기능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관련업계가 MS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도비시스템스는 우선 PDF기반으로 전자책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문서보안솔루션을 집중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콘텐츠 유료화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드물게 전자책분야에서만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회사는 또 이미지·동영상 등 일반 디지털콘텐츠분에서도 유료화가 정착될 경우 이에 필요한 솔루션을 바로 선보이는 철저한 ‘시장성’을 최우선 사업전략으로 삼고 있다.
IBM의 전략은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태의 솔루션개발이 유력시된다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이를 토대로 인터트러스트처럼 솔루션 상용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기 기존에 갖고 있는 강력한 분야별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또 궁극적으로 이미지·동영상·텍스트·문서 등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직접 경쟁구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업계 반응=기존 업계가 다급해졌다.
인터트러스트는 최근 MS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중이다.
이들 전문 기업은 기술력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막강한 마케팅과 시장지배력 앞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려도 크지만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는 이들 기업의 시장참여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서 보안, 웹관리 보안 등 이들 IT대기업과 직접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시장 발굴을 통해 얼마든지 사업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