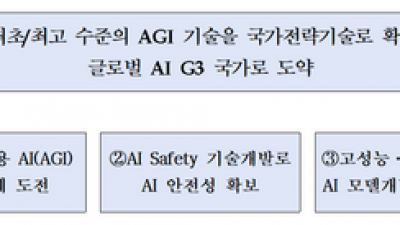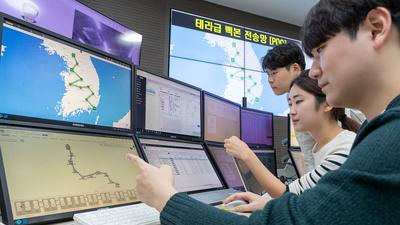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이현덕 논설실장 hdlee@etnews.co.kr
가을의 문턱을 넘는다. 가을은 지금 절기의 바통을 다음 주자인 겨울에 넘기주기 위한 마무리 손놀림에 분주한 모습이다.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쉬울 법도 하건만 가을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하고 해맑다.
파란 하늘, 가을걷이가 한창인 들녘,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홍시, 산과 들을 온통 오색실로 수놓은 단풍, 돌담 위의 누런 호박, 보도 위를 구르는 노란 은행잎, 들판의 허수아비, 소슬바람의 감촉, 코스모스의 나풀거림 등 이런 것이 정겨운 가을 풍경이다.
가을의 모습을 보면 새삼 자연의 오묘한 이치와 초연함에 전율을 느낀다. 자연의 조화는 무언(無言)의 행동이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조용히 변화에 순응한다. 자신의 역할에 오차가 없다.
소유했던 것도 미련두지 않고 버린다. 상대를 미워하는 일도 없다. 자연은 누구를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신의 특성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뿐 손익을 따지는 법이 없다.
우리 주변의 나무를 보라. 가을이면 여름 한철 입었던 푸른 옷을 훌훌 벗는다. 나신(裸身)으로 겨울 채비를 한다. 싫다고 버티는 법이 없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새옷을 만든다. 여름이면 신록(新綠)의 옷으로 치장한다. 가을이면 입었던 옷을 몸에서 털어낸다.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나무는 순종한다. 그것이 생존의 길임을 나무는 안다.
그런데 요즘 세상살이는 다툼이 너무 많다. 시비가 많다 보니 시끄럽다. 어느 철학자가 속세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어 시끄럽고 고통이 뒤따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철학자는 “천국에는 즐거운 일만 있다. 그런가 하면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속세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쁨과 고통이 함께 상존한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우리 경제는 계속 추락한다. 미래도 불투명하다. 믿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까지 14년만에 분기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산 철강제품은 미국에서 산업피해 판정을 받았다. 우리 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런데도 정치판에는 각종 의혹과 비리설이 난무한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상대방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한쪽은 생사람 잡는 무책임한 폭로라고 펄펄 뛴다. 한쪽은 상대가 검다고 한다. 반면 상대 측은 왜 흰 사람을 검다고 하느냐며 목청을 높인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헷갈린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인가. 둘 중 하나는 거짓일 것이다. 계속되는 수돗물 공방, 정치협오증을 부채질하는 정치권의 헐뜯기 경쟁 등에 대한 진실도 궁금하다. 누가 양심적이며 진실을 말하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양심적이고 똑똑하던 사람도 정치판에 뛰어들면 백로탈을 벗는다. 말 따로 행동따로를 다반사로 한다. 왜 그런가. 정말 국회가 불랙홀인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 살림살이가 풍족해졌다. 국민의 끝없는 교육열과 지식정보화로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도 도덕성의 타락은 갈수록 더 심하다. 원인이 궁금하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이 결여되면 부패하기 십상이다. 부패는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다.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 국민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국력결집이 안된다. 난마처럼 얽힌 지금의 경제위기 타개도 어렵다.
이제 모두 나무처럼 세상일에 초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답이 나온다. 세상에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자연은 분수 밖의 일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투정하거나 음해하지 않는다. 가을의 문턱에서 자연이 인간한테 주는 무언의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