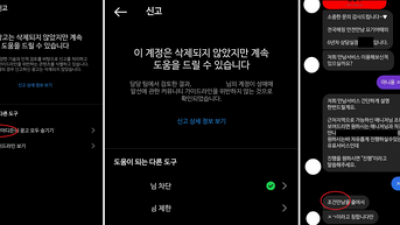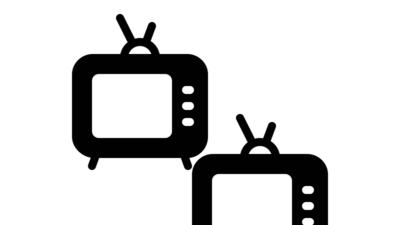국내 인쇄회로기판(PCB)업계가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응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는 2000년대는 디지털TV를 비롯한 차세대 영상매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반도체·네트워크시스템 등 대량의 PCB 수요를 동반한 전자정보기기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지금부터 진척시켜야 되지만 섣불리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 차세대 제품을 겨냥한 신규 설비투자 규모는 과거 설비규모와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층인쇄회로기판(MLB)을 비롯한 기존 PCB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반도체 패키지와 고다층·초미세패턴 기판용 설비투자 규모는 300∼50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비슷한 규모의 PCB 생산능력을 갖추더라도 투자비는 과거에 비해 3∼5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 여기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는 것도 PCB업계가 선뜻 나설 수 없는 이유다.
막대한 투자를 단행, 생산라인을 구축했을 때 이미 타깃으로 설정한 시장이 쇠퇴기에 접어들거나 과당경쟁으로 투자비를 건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여타 분야에 투자했을 때를 상정한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투자 위험은 더욱 커진다.
또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기업 인수합병(M&A)에 뒤따른 산업구조 개편바람도 PCB업계의 투자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거래하는 외국 유명기업의 성장성을 고려, 설비투자를 단행했을 때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 피인수될 경우 거래관계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M&A로 거래선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한 PCB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M&A로 특정 산업에서 주도권을 쥔 거대 기업은 PCB를 비롯한 각종 부품·기자재의 구매선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업체에게 몰아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아웃소싱시장이 소수·대형화된다는 것. 이는 국내 PCB업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과 공급능력을 확보해야만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BGA(Ball Grid Array)기판과 CSP(Chip Scale Package) 분야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벌써 빚어지고 있다. 국내 한 PCB업체는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나 인텔로부터 제품 사용승인을 얻지 못해 사업방향을 전면 재편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내 PCB업체가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적 투자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또다른 까닭 중 하나는 「분산과 집중」이라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 PCB업체들은 페놀계 단면 PCB로 사업을 시작, 양면PCB와 MLB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왔고 일부 선발업체는 빌드업기판과 반도체 패키지기판 분야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지금도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페놀계 단면 PCB부터 첨단 반도체 패키지기판까지 생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특정 PCB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백화점식으로 값싼 PCB는 제조할 수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 PCB업체도 특정 분야를 전략적으로 특화,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할 때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과거처럼 누더기식 설비증설로는 급변하는 세계 PCB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9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10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