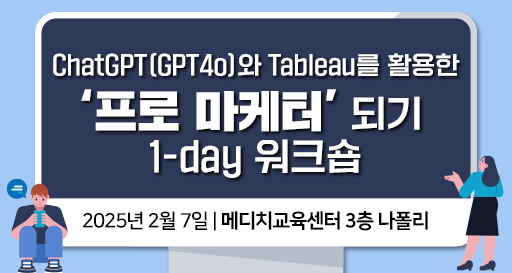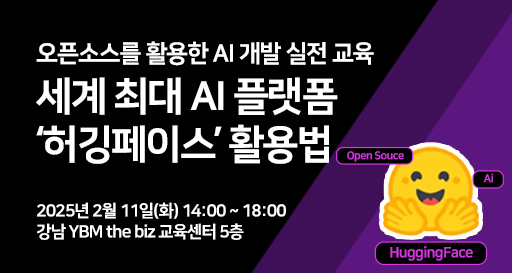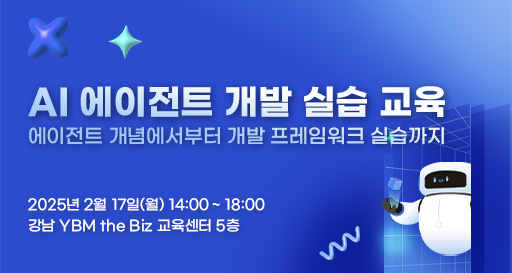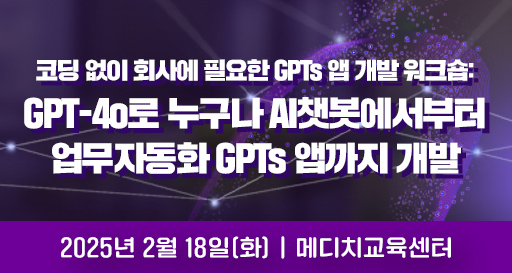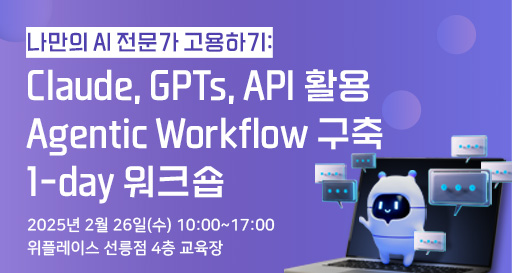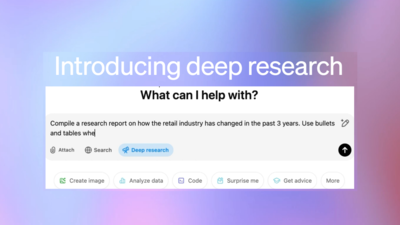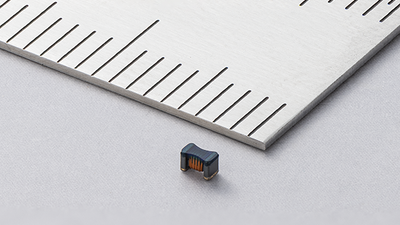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이제까지 사업성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쓴 것만도 트럭 한 대분은 족히 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개발로 이어진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현대전자 C차장)
『무엇보다 축적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시스템 응용기술을 꿰뚫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적어 비메모리 개발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LG반도체 J부장)
『전략적 제휴나 상호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외국에서 핵심코어와 설계기술을 비싼 돈 주고 들여와 사용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보니 한두 제품 샘플출시 후 사업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기 일쑤였다. 핵심기술을 사다 쓰니 작은 에러에도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개발작품이 아닌 관계로 제품에 대한 애정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삼성전자 K과장)
이들 반도체 3사 비메모리 담당 실무자들의 목소리는 국내 비메모리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D램과 같은 단품종 대량생산에 재미를 본 정서로는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비메모리사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 위주이다보니 경제성을 맞추기가 힘들고 이는 당연히 해당업체의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구조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없이는 비메모리사업부는 영원한 「찬밥」일 수밖에 없다.』(산업연구원 주대영 선임연구원)
반도체 3사가 비메모리사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시기가 D램 호황이 극에 달한 93년 무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성」에 대한 체감은 「당위성」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되는 대목이다.
『당시만 해도 D램을 생산할 경우 8인치 웨이퍼 한장당 4천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를 비메모리로 전환, 칩을 생산하게 되면 2천달러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메모리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낼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삼성전자 C임원)
그러나 D램 가격급락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비메모리는 생산구조의 다변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익성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도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기업 생리상 실적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업성과가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비메모리사업부를 이같은 잣대로 잴 경우 비메모리사업의 앞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축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성과위주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승진 등 여러가지 면에 불이익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엔지니어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현대전자 M임원)
『학교 다닐 때는 교수들이 한결같이 비메모리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나 자신도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비메모리부서를 원해 3년 넘게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나의 결정에 대한 회의감이 더 든다. 선배들을 보니 메모리부서에 비해 진급과 대우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요즘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삼성전자 P연구원)
지난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는 17억달러 정도. 주요 품목별로 보면 아날로그 5억달러, 개별소자 5억달러, 로직IC 5억달러, 마이크로 1억8천만달러, 바이폴러IC 2천만달러 등이다. 그나마도 세계적인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마이크로컴포넌트 비중이 턱없이 적은 대신 동남아시장을 대상으로 한 저가의 범용소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메모리시장에서 삼성과 1, 2위를 다투는 일본 NEC가 세계 비메모리시장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반도체 3사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 크다. 현업 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반도체 3사가 피땀흘려 일으킨 「메모리 신화」는 절름발이 신화로 남을 뿐이다.
<김경묵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천장 공사없이 시스템에어컨 설치…삼성전자, 인테리어핏 키트 출시
-
2
'챗GPT' vs '딥시크' 영문보고서 AI 추론 능력 비교해보니 '막상막하'
-
3
中 딥시크 사용 제한 확산…미국·대만·일본·이탈리아 등 확대
-
4
캐나다·멕시코·中에 보편관세 부과…트럼프, 무역전쟁 개시
-
5
한국형 '딥시크' 키우자...전문가들 “인재양성과 규제완화가 핵심”
-
6
관세 직격탄 맞은 韓 가전·자동차·배터리, 美 소비자가격 오르나
-
7
관세전쟁에 금융시장 요동…코스피 2.5% 급락
-
8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1심 이어 2심도
-
9
에스오에스랩-동운아나텍, 라이다 협약 체결…'8조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 공략
-
10
日 삼성월렛 서비스 시작…갤S25 시너지 노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