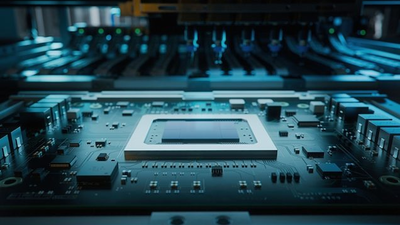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 '폰값 거품'을 줄이고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법 시행 전 이동통신 시장은 '번호이동 폭탄'과 '기기변경 역차별'이 만연했다. 특정 시점·특정 고객층에만 수십~수백만원의 보조금이 쏟아졌다. 같은 기기를 사더라도 소비자마다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최대 15%로 규제해 이러한 불합리를 막으려 했다.
시행 직후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보조금 상한 규제로 출시 초기 고가 단말기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호갱'이 됐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통법 부작용도 부각됐다. 가격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지원금 경쟁이 줄어 고가폰 중심 구조가 고착됐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2017년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일부 완화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있었다.
결국 2025년 7월 22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했다. 공시지원금 고지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제공할 수 있는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폐지 이후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조건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일부 이용자가 불리한 조건에 계약할 가능성도 커졌다.
2014년 시행과 2025년 폐지를 거친 단통법은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규제에 의한 안정'과 '자율 경쟁에 의한 활력'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모색한 실험이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